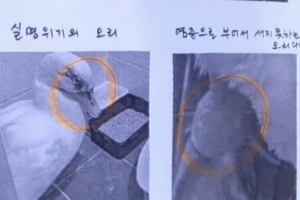대부분 고개 숙이고 대사… 감정 토해내
흥행도 좋지만 좋은 영화로 기억되길”

최명길을 연기한 이병헌(47)은 아이디어가 많은 배우로 유명하다. 좋은 생각이 떠오르면 즉석에서 감독과 의논해 명장면, 명대사도 곧잘 만들어 낸다. ‘남한산성’에서는 그러지 않았다. 시나리오도 완벽했고, 감독이 원하는 바도 명확했기 때문이다. 배우로 욕심을 낸 건 딱 한 장면뿐. “명길은 말을 할 때 늘 차분하고 부드럽게 우회적으로 돌려 가며 표현하는 캐릭터예요. 감정을 누른 채 이야기하죠. 마지막 논쟁 장면만 상의했어요. 직구를 날리는 느낌으로 바꿔 보고 싶었거든요. 통쾌했습니다.”
간간이 전투 장면이 있지만 인조(박해일)를 앞에 두고 최명길과 김상헌(김윤석)이 펼치는 논쟁이 중심이다. 여느 작품보다 대사량이 많다. 긴 호흡의 대사도 자주 등장한다. 배우들이 버거워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다. “‘남한산성’에서는 대사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어떤 화려한 액션보다 훨씬 강력하고 더 뜨겁고 가장 큰 무기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말들이 어렵긴 하죠. 그 치열함과 숨막힘, 심각했던 상황을 어떻게 온전하게 표현할지 고민이 많았죠.”
세 번째 사극이다. 첫 도전이었던 ‘광해, 왕이 된 남자’를 통해 천만 배우로 등극했다. 대개 처음엔 적응하기 쉽지 않은 게 사극이라는데 이병헌에겐 출발부터 맞춤옷이었다. “사극 톤보다는 그 시절을 살던 사람의 예법과 마인드를 갖고 연기하려는 데 초점을 맞춰요. 지금 보면 영 아닌데 그 시절엔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 있지요. 시대를 달리하는 작품을 찍을 때는 당시 입장에 서려고 애쓰는 편이죠.”
연기적으로 새로운 경험도 했다고 한다. “명길은 칠팔할 이상을 고개를 숙이고 있어 땅바닥과 이야기하는 느낌이 들 정도였어요. 그렇게 내려다보며 모든 감정을 토해 내 임금을, 관객을 설득하고 재미까지 전달해야 했는데, 새로운 경험이자 모험이었죠.”
아무래도 설전을 펼쳤던 김윤석과의 호흡을 물어보지 않을 수 없었다. 어느 한쪽이 밀리는 느낌이었다면 영화는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렸을 터. “둘 모두 왕을 향해 머리를 조아리고 대사를 해 촬영하면서도 얼굴 볼 일이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옆에서 대사의 떨림, 소리만 들으면서도 열을 가득 품은 배우라는 걸 알 수 있었죠.”
380년 전의 그날은 내우외환의 오늘날과 놀랄 정도로 맞닿아 있다. “원래 시류를 타고 기획된 작품은 아니에요. 공교롭게도 지금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 그때와 다를 바가 무엇인지 촬영을 하며 서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지요. 강대국 틈에 끼어서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 정도 차이가 있을 뿐이지 반복됐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패배와 치욕의 이야기에다 오르내림 없이 낮고 건조하게 흐르는 이야기에 많은 관객이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을지 물음표를 던지는 경우도 있다. “극장에 걸렸을 때 많이 봐서 흥행하면 좋지만 좋은 영화라고 인식이 돼 긴 시간을 통해 많이 보게 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16년 전 개봉한) ‘번지 점프를 하다’를 아직도 찾아보는 분들이 있어요. 어느 쪽이든 저에겐 의미가 있어요. 좋은 작품으로 오래 남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죠.”
홍지민 기자 icar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