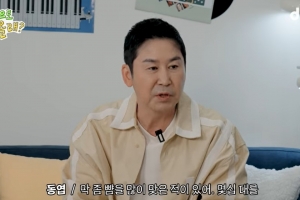조세포탈엔 ‘저승사자’…이철희·장영자 & 명성그룹 사건 역사에 남아
1962년부터 시작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마무리할 때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고민에 빠졌다.1967년부터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해야 하는데, 막대한 재정 수요를 충당할 뾰족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국내에선 조세 제도나 납세 의식이 자리 잡지 못해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았다.
조세를 담당하는 기관은 따로 없이 재무부(현 기획재정부) 내 부서에서 처리되고 있었다.
6·25 전쟁 여파로 조세 행정은 제대로 정착되지 못했다.
일본 강점기엔 조세 저항을 식민지 통치에 반발하는 독립운동으로 여겨 납세자나 기업이 탈세를 부도덕한 범죄로 인식하지 못할 때였다.
고심하던 박 대통령에게 해법을 제시한 것은 미국 경제학자 리처드 머스그레이브 교수였다.
미국 하버드대 머스그레이브 교수는 1965년 7월부터 2개월간 경제 고문단으로 있으면서 신규 세원을 발굴하고 탈루 세금을 관리하려면 세무 업무를 전담할 기구(국세청)를 신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대통령은 머스그레이브 교수의 제언을 받아들여 이듬해 1월 국세청 신설을 발표하고 불과 2개월 뒤인 1966년 3월 3일 국세청을 열기에 이르렀다.
정식 본청을 구할 시간이 넉넉지 못해 훗날 결혼식장으로 쓰인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의 한 건물에 임시 청사를 마련해 출발했다.
◇ 국세청이 거두는 세금 50년 새 2천974배 규모로
국세청장을 처음 이끈 것은 군인 출신인 이낙선 초대 청장이었다.
박 대통령은 이 청장에게 개청 첫해 세수 700억원을 달성하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직전 년도 실적이 421억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66.5%나 늘어난 당시로선 엄청난 규모였다.
재무부나 정치권에선 달성이 어려운 목표라는 비관적인 목소리가 작지 않았다.
그러나 이 청장은 자신의 관용차 번호판을 ‘관 1-700’으로 달고 다닐 정도로 연간 세수 700억원 달성에 대한 굳은 의지를 다졌다.
그는 특히 박 대통령이 국세청 개청 즈음에 써준 ‘견금여석(見金如石·황금 보기를 돌같이 한다)’ 휘호를 새긴 녹색 넥타이를 매고, 세무 사찰에 필요한 비품을 넣어서 다닐 수 있는 007가방을 직원들에게 나눠주는 등 조직 기강을 잡았다.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국세청은 개청 첫해 내국세수 700억원을 달성하는 성과를 내고 재정 자립의 기틀을 마련했다.
그러나 1970년대 들면서 국세청은 위기를 맞게 된다.
제1차 오일쇼크와 극심한 인플레이션, 환율 상승 등으로 세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다.
난관을 뚫고자 1977년 부가가치세제를 도입한다.
이전까지 모든 거래단계에서 세금이 붙는 영업세 대신 부가가치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겨 누적과세에 따른 물가 상승을 차단하기 위해서였다.
실제로 부가가치세가 도입되고서 시행 6개월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시행 전보다 낮아졌다. 원가 상승 압력이 제거되자 수출과 투자 쪽에도 숨통이 트였다.
1980년대 들면서 한층 합리적인 세정을 구현하는 발판을 마련한다.
1979년 12월 법인세법을 개정, 정부가 세금을 매기는 방식에서 납세자가 신고하는 방식인 신고납세제도를 직접세 분야에서 최초로 도입한 것이다.
법인의 덩치나 거래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국세청이 세금을 부과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제화, 전산화 바람이 거세진 1990년대에는 전산조사 전문요원을 전문적으로 양성하고 국제조세국을 중심으로 업무 영역을 확대하며 성장을 거듭했다.
1996년에는 소득세의 확정방식도 부과과세제도에서 신고납세제도로 바꾼다.
2001년에는 홈택스시스템을 구축하고 2005년 현금영수증제도를 도입하는 등 납세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시도를 이어오고 있다.
개청 후 50여 년이 흐른 지난해 국세청의 세수는 역대 최대인 208조1천600억원을 기록했다. 개청 첫해보다 2천974배 늘어난 규모다.
납세자 수는 254만8천명에서 1천465만8천명으로 5.8배 늘었다. 직원 수는 5천500명에서 1만9천여명으로 증가했다.
서대문에서 처음 문을 연 국세청 본청은 1967년 1월 관훈동으로 옮겼다.
이후 광화문, 태평로, 양평동, 수송동, 종로타워 시절을 거쳐 다시 수송동에 둥지를 틀었다가 2014년 12월 세종시에 정착했다.
◇ 국세청 역사에 남은 이철희·장영자 & 명성그룹 사건
세금 탈루를 잡아내는 국세청 세무조사는 정치적 논란 속에서 몇 차례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다.
1982년 이철희·장영자 부부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철희·장영자 부부는 1981년 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자금 압박에 시달리는 건설업체에 자금을 조달해 주고 그 담보로 대여액의 최대 9배에 달하는 약속어음을 받았다.
그들은 받은 약속어음을 할인해 또 다른 회사에 빌려주거나 주식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어음을 유통해 사기행각을 벌였다.
국세청은 조세 포탈 조사 후 이씨·장씨 부부 등 사건 관계자 19명에게 소득세 탈루액 142억원, 장씨 부부와 거래한 법인에 법인세 탈루액 82억원을 추징했다.
이 사건으로 공영토건, 일신제강 등 기업이 도산하고 집권당 사무총장과 법무장관이 경질됐다. 총리를 비롯한 주요 장관을 바꾸는 개각이 단행되는 등 후폭풍이 지속됐다.
1980년대 콘도미니엄, 골프장 등을 경영하며 신흥 종합레저그룹으로 떠오르던 명성그룹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한 것도 국세청의 힘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다.
명성그룹은 출범 5년 만에 21개 계열사를 거느린 대기업으로 성장했는데,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친인척이 연관돼 있다는 소문이 무성했다.
자금 출처를 의심한 국세청은 전격 세무조사를 벌였다.
명성그룹은 신문 광고를 내고 국세청 세무조사를 비판하며 맞불을 놨지만 112억원의 세금 포탈 사실 적발돼 결국 공중분해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