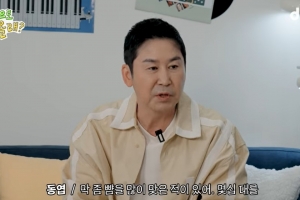김홍민 북스피어 대표
어쨌거나 이왕 거기까지 갔으니 샌프란시스코의 상징으로 일컬어지는 ‘시티 라이츠 북’을 둘러보지 않을 수 없었다. 당시 비트 세대를 돕기 위해 시인 로런스 페링게티가 차린 이 서점에서 히피 문화가 싹텄다는 것은 유명한 이야기다. 하지만 그토록 유서 깊은 장소에서 내가 느낀 것은 보헤미안적 자유분방함이나 영혼을 달래 줄 해방감 같은 게 아니었다. 그것은 변의, 이 글을 쓰는 지금 돌이켜 봐도 식은땀이 줄줄 흐를 만큼 강력한 변의였다.
평소에도 그런 건지 서점 안은 혼잡했다. 게다가 좁은 통로에는 책이 꽉 들어차 있었다. 나는 백설공주가 먹다 버린 사과를 집어삼킨 심정으로 배를 부여잡고 가파른 계단을 몇 번이나 오르내린 끝에 겨우 화장실을 찾을 수 있었다. 하마터면 난감한 상황과 맞닥뜨릴 뻔했다. 그제야 한숨을 돌리며 변기에 앉아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아침에 뭘 먹었던가. 아메리카식 모닝 식사를 만끽한답시고 팬케이크를 잔뜩 먹지 않았던가. 아마도 그래서인 모양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 뒤로 나는 여간해선 팬케이크를 먹지 않는다.
어쩌면 팬케이크의 잘못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심증을 가지게 된 건 인터넷에서 본 기사 덕분이다. 일본에선 한때 ‘왜 서점에 가면 화장실에 가고 싶어지나?’라는 문제가 전국구적 화제로 떠오른 적이 있다고 한다. 이 ‘서점에 가면 변의를 느끼는 것’을 아오키 마리코 현상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1985년 4월 발행된 ‘책의 잡지’(本の雑誌)에 실린 어느 독자의 엽서에서 유래했다. 내용은 “서점에 가면 왠지 변의를 느낍니다. 이유가 뭔가요?”(아오키 마리코·회사원)라는 것이었다.
이 문제를 두고 여러 전문가와 매체들이 머리를 맞대고 공방을 벌인 끝에 (1)책을 인쇄할 때 사용하는 잉크에 포함된 화학물질이 인간의 뇌에 영향을 줬으리라는 설 (2)대량의 책에 둘러싸여 ‘지금 나에게 필요한 책은 무엇인가? 이렇게 많은데 과연 찾을 수 있을까?’라는 초조함 때문이라는 설 (3)과거에 한 번이라도 서점에서 화장실에 간 적이 있으면 서점에 들어선 순간 조건반사적으로 가고 싶어진다는 설이 제시됐다고 한다. 그렇다면 나는 (1)+(2)+(3)에 더해 영어 활자로 뒤덮인 서점이라는 압박 때문에 더욱 강력한 그것을 느꼈던 게 아닐까.
며칠 전 위의 내용을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많은 분들이 “어, 나만 그런 게 아니었나” 하며 격하게 공감을 표시해 주었다. 그중에는 “서가에서 책을 찾느라 쪼그려 앉기도 하는 자세가 장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닐지”라는 유산균 캡슐과도 같은 영양가 만점의 댓글도 있었다. 그야말로 천지명찰적 통찰력이라고 생각한다. 덕분에 팬케이크에 대한 불신을 조금쯤 떨쳐 낼 수 있었다. 감사드린다.
아울러 서가의 책들을 정리하느라 오늘도 묵묵히 쪼그려 앉아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고 계실 서점(과 도서관)의 담당자분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2016-02-18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