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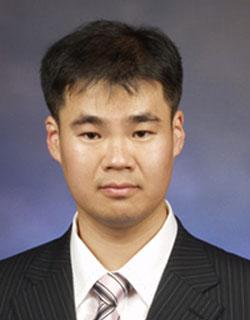
김동현 사회2부 기자
동물원 측이 사전에 안전 문제에 조금만 더 신경을 썼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안타까운 사고였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숨진 사육사 김씨는 이날 혼자 사자 방사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발견 당시 안전장구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사자에게 공격당한 뒤 24분이 지나서야 구조를 받을 수 있었다.
과천 서울대공원은 2013년 사고 이후 맹수들을 돌볼 때엔 2인 1조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지난해 3월에는 동물원 운영과 관련한 매뉴얼도 개편했다. 매뉴얼 개편의 중심은 안전이었다. 민간에서 운영하는 한 동물원은 폐쇄회로(CC)TV 모니터 전담 요원과 사육장 관찰 요원 등 3명이 맹수를 관찰하며 작업을 진행한다. 하지만 김씨는 혼자였다.
이에 대해 어린이대공원 관계자는 “동물원의 상황에 따라 매뉴얼을 달리하는 것이 가능하다”면서 “꼭 서울대공원과 매뉴얼이 같을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른 동물원 관계자는 “동물원의 상황에 따라 매뉴얼을 달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틀리지는 않았지만 호랑이나 사자 등 위험성이 높은 맹수의 관리는 일반적으로 안전성을 위주로 짜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쉬운 점은 또 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사자 방사장과 내실(우리)의 CCTV에 사각이 존재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한마디로 부족한 인력을 채워 줄 시설 투자도 제대로 안 했다는 뜻이다.
결국 1년 전 과천 서울대공원의 사고로 축적된 ‘오답노트’가 능동 어린이대공원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틀린 문제를 또 틀렸다. 한번 사고가 발생하면 실수지만 반복되면 의지의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다. 지난해 세월호 사고 이후 가장 강조돼 온 ‘안전’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때만 가능하다.
moses@seoul.co.kr
2015-02-14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