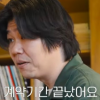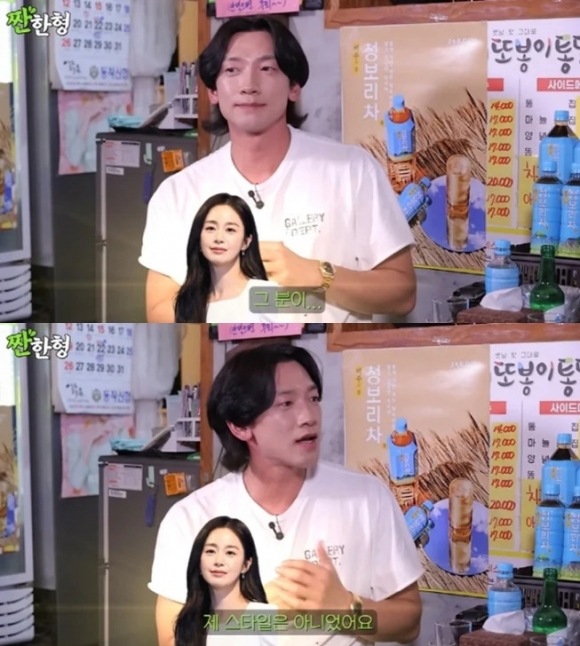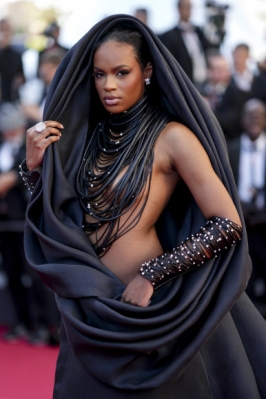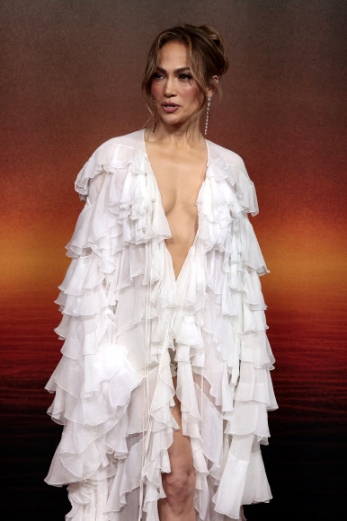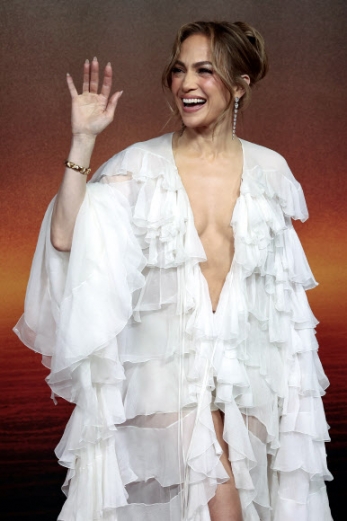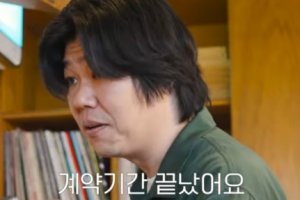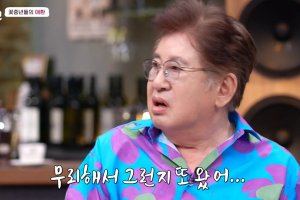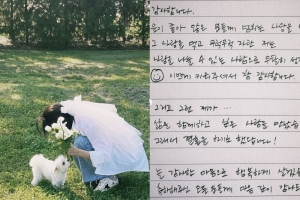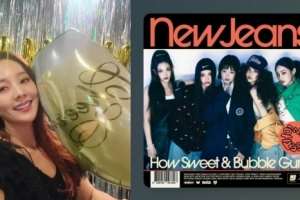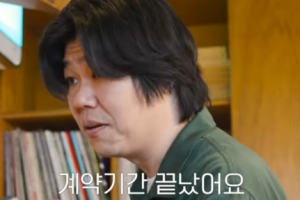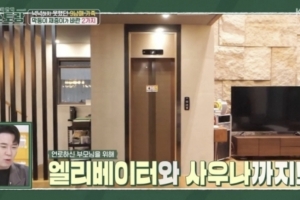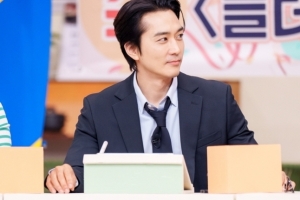‘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 ‘빈집’과 ‘비몽’을 만든 감독의 작품으로서는 실망스러운 퇴행이다. 파국으로 치닫는 한 가족의 이야기는 영화가 끝나면서 무기력하게 스크린 속으로 침잠해 들어간다. 가족, 욕망, 성기라는 키워드로 시작한 영화가 결국 가족, 욕망, 성기를 날것으로 보여주고 끝난 바로 그 방식 그대로 말이다.
거세당한 남자가 자신의 잘려진 성기를 되찾기 위해 절뚝거리면서 아들을 쫓아가는 장면을 보자. 거세당한 두 남자는 성기를 두고 길 한복판에서 몸싸움을 벌인다. 결국 성기는 길바닥에 던져지고 무심한 자동차들에 의해 짓밟힌다. 욕망의 대상에 대한 인간의 집착과 그 결과를 보여주는 장면이다. 이렇게 직접적인 사건과 이미지들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의 소설처럼 또박또박 의중을 전달한다. 좋게 말하면 친절하고 유머러스하다. 하지만 영화의 수위나 감독의 성향을 고려했을 때 ‘뫼비우스’는 결코 그렇게 사려 깊고 재치 있는 영화가 아니다.
나쁘게 말하면 유치한, 일차원적인 표현력이 실소(失笑)를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다. 김기덕 영화들이 일관성 있게 보여주었던 뒤틀린 상상력은 언제나 호불호의 논쟁을 불러일으켰지만, 이 영화에서는 그런 상상력 자체가 빈약하다는 것이 문제다. 스스로 두 번째 거세를 한 다음 바로 스님으로 분하는 아들의 캐릭터가 보여주는 것처럼 말이다.
욕망을 둘러싼 가족들의 이야기 역시 소재의 강렬함을 넘어서는 정서적 임팩트가 없다. 아들이 아버지의 성기를 가지게 되고, 어머니를 통해 욕망을 충족시킴으로써 뫼비우스의 띠처럼 연결되는 세 인물은 저마다 고통 속에 있다. 그런데도 그들의 감정에 동화되기는 좀처럼 어렵다. 공감보다는 파격을 지향한 감독의 욕망이 이런 식으로 작동한 것은 아닐까. 그러나 17년 동안 상업영화의 궤도를 벗어난 작품들을 만들면서도 주목받는 법을 아는 그의 작품들은 평자들에게도 애증 병존의 대상이기에, 다시 스무 번째 작품을 기다려 본다.
윤성은 영화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