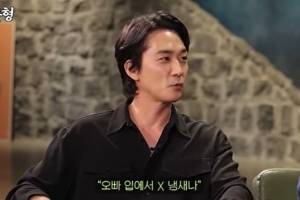‘사랑의 시대’ 원제가 ‘공동체’(The Commune)라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이 영화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감독 토마스 빈터베르그는 7살 때부터 19살 때까지 공동체에서 자랐다. 그는 영화를 찍는 데 이때의 체험이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고백한다. “‘더 헌트’를 포함한 내 영화의 대부분은 공동체와 개인을 다루고 있다. 내가 생각하기에 공동체는 확장된 가족 같다. 함께 살다 보면 어느 정도 선에서 노력을 멈춘다. 많은 결혼생활에서 발생하는 일이다. 같은 집에 살고 서로의 옆에서 자게 되면 겉모습은 벗어버리게 된다. 인간으로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보이길 원하는 대로 자신을 꾸민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공동체에서는 인간의 모든 것을 보게 된다.”
68혁명의 여파로 탄생했으나, 공동체가 내건 이상은 현실과 부딪쳐 삐걱댄다. 가령 비싼 집세를 누군가는 내는데, 누군가는 내지 않는다는 경제적 문제로 인한 갈등이 불거진다. 그보다 심각한 것은 애정의 문제다. 대학생 엠마(헬렌 레인가드 뉴먼)와 사랑에 빠진 에릭은 그녀를 공동체에 들이자고 한다. 그러면서 그는 본인이 대저택을 제공했고, 집세도 부담한다는 압력을 행사했다. 68혁명의 정신은 이렇게 변질됐다. 평소 자유연애 혹은 “자기감정을 따를 권리”를 존중하는 입장이던 안나의 내면도 그때부터 부서지기 시작한다. 집과 음식을 공유할 수는 있어도, 사랑을 공유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혁명으로도 전복하기 힘들다. 사랑은 독점적 권력이다. 2월 2일 개봉. 청소년관람불가.
허희 문학평론가·영화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