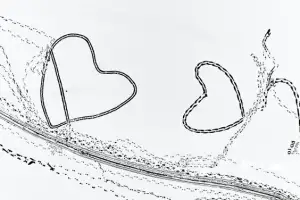맨살이 노출됐을 때 동상 걸릴 위험 측정한 것…지나치게 단순화
“기온 떨어지고 바람까지 불어 체감온도 뚝”한파가 찾아오면 함께 등장하는 이런 일기 예보는 어깨를 더욱 움츠러들게 한다.
영하 기온인데 바람까지 불면 더욱 춥게 느껴지기 때문에 체감온도가 기온보다 더 낮은 것은 자연스럽다.
그러나 일기예보에서 말하는 체감온도가 실제 사람들이 느끼는 날씨를 제대로 반영하지는 못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미국 인터넷 매체 복스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폴란드의 인체 열역학 전문가인 크시슈토프 블라제이치크는 체감온도를 도출하는 공식이 애초부터 실제 사람이 느끼는 온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체감온도를 측정하는 공식은 “옷을 입지 않은 맨살이 노출됐을 때 동상에 걸릴 위험을 측정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1940년대 남극에서 연구활동 중이던 미국인 과학자 2명은 바람이 불면 열 손실이 빨리 일어난다는 통념을 측정하려고 물이 든 병을 밖에 매달아 놓고 물이 어는 속도를 관찰했다.
이를 시간당 ㎡에서 발생하는 열 손실이 몇 ㎉로 표현하는 ‘풍속 냉각 지수’로 만들었다.
1960년대 추운 지방에서 임무를 수행하도록 군인들을 훈련하고자 했던 미군 연구원이 이 복잡한 지수를 실용적으로 활용하려면 알기 쉽게 기온으로 표현하자는 생각을 내놨고, 이후 기상예보관들이 오늘날 ‘체감온도’ 개념으로 사용하면서 현재까지 이어져 온 것이다.
‘원시적’인 수준에 가까웠던 남극의 실험 대신, 인디애나 대학의 모리스 블루스타인은 2001년 물병 속의 물이 아닌 실제 인체에서 일어나는 열 손실을 측정해 보다 현실적인 새로운 공식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이 역시 기온과 풍속에 따라 동상에 걸릴 위험을 수치화한 것으로 실제 사람이 느끼는 추위를 반영하지는 않는다는 근본적인 한계는 여전하다.
또 이 공식은 모든 사람을 완전히 똑같은 체형으로 가정한 것이다. 실제 캐나다에서 이뤄진 실험에서 개인의 체형에 따라 열 손실이 크게 달랐다.
블루스타인은 “체지방이 많은 사람이 동상에 걸릴 위험이 크다”며 “몸 안에 열을 훨씬 효과적으로 보존해 외부와 가까운 피부에는 열이 잘 전달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험은 일정한 바람을 맞으며 시속 5㎞로 걸어가는 상황을 가정하고 이뤄진 것으로, 걷거나 뛸 때 달라지고, 건물이나 나무 등 바람을 막아주는 주변 상황을 고려하지 않으며 햇볕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후 일반기후지표(UTCI)처럼 기온과 풍속 외에 습도, 일사량은 물론 사람들이 옷을 어떻게 입을지까지 예상해 체감온도를 산출하는 공식도 있지만, 이를 일기예보에 활용하는 나라는 폴란드뿐이다.
그렇다면 잘 맞지도 않는 기존의 체감온도 공식은 왜 계속 쓰이는 것일까.
미국 국립 기상국이 기존의 체감온도 공식을 고수하는 것은 이 공식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만들어져서 사람들이 동상에 걸릴 위험성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하기 때문이라고 복스는 전했다.
또한,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정확한 위치에 따라 하루에도 계속 달라지는 수많은 요인을 고려해 새로운 공식을 만드는 것도 그다지 효과적이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블루스타인은 “더 많은 변수를 고려할수록 사람들이 사용하기는 더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부끄럽다” 한국인도 안 하는 걸…홀로 산속 쓰레기 치운 외국인 [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1/26/SSC_20260126075851_N2.jpg.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