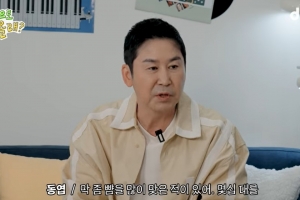설치작가 이예승 개인전, 새달 3일까지
벽에 걸린 모니터의 화면은 칠흑 같은 어둠이다. 정지된 듯 보이는 화면은 아주 천천히 움직이고 있다. 간간이 별이 빛나는 칠흑 같은 하늘이 영원의 시간 속에서 흘러가는 것 같다. 그러나 하늘인 줄 알았던 것은 실은 굵은 일필의 획으로 그린 수묵화를 원통형으로 말아 세우고 카메라가 그 이미지를 찍어 실시간으로 보여 주는 것이다.

미디어·설치작가 이예승
작품의 서사와 이미지들은 중국 고대 지리서 ‘산해경’(山海經)을 토대로 한다. 산해경에는 신화 시절 동아시아 주변의 지리에 대한 설명과 그 지역에 살던 희귀한 사람과 동식물 등이 묘사돼 있다. 작가는 “그 시절의 사람들은 아무런 편견 없이 이런 변종들과 어울려 살았다”면서 “기술과 인간이 혼동된 이 시대의 모습이 그와 흡사하다는 것을 보여 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전시장 1층은 정중동의 공간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정지된 것이지만 사실은 움직이고 있다는 의미를 강조한다. 전면을 한지로 감싼 바로크 양식의 가구는 공간의 움직임을 감지해 빛을 발산한다. 페인팅과 영상을 접목시킨 평면작업은 낮과 밤의 시간차에 따라 다른 화면을 보여 준다. 산해경에 나오는 반인반수의 기이한 이미지처럼 본래의 기능이 변형되고 조합된 형태를 갖는 것들이다. 지하 전시장은 동중동의 공간이다. 원형의 대형 스크린과 실린더 형태의 설치 등 모든 것이 움직이는 키네틱적인 요소와 사운드로 가득하다. 민낯을 드러낸 기계 장치들이 레이스 모양의 그림자와 어우러져 현실과 가상의 경계를 넘나든다.
이예승 작가는 이화여대 미술대학 동양화과를 나와 미국 시카고아트인스티튜트에서 미디어 아트를 전공했다. 수묵화와 디지털미디어의 만남은 작품에서 은연중에 드러난다. 기계적인 작품들이지만 인간적이고 정적인 느낌이다. 작가는 “수묵의 필선이 설치작품의 기계장치와 프로그램, 전선으로 바뀐 셈”이라면서 “화선지 위에서 붓으로 먹의 농담을 조절하는 훈련이 되어 있어서인지 빛의 밝기, 소리의 강약을 표현하는 데 아무래도 자유롭다”고 말했다. 전시는 3월 3일까지.
함혜리 선임기자 lotus@seoul.co.kr
2016-02-16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