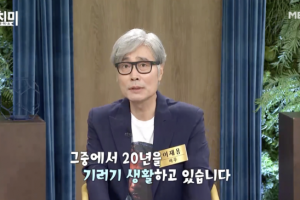글 김주영 그림 최석운
“내 말은 포주인이 그 비린내 나는 목숨을 부지하려고 우리 상단의 동정을 도둑의 소굴에 팔았다는 것이오. 어디 그뿐이겠소. 적굴 놈들의 장물아비가 되어 잠은도매(潛隱盜賣)하고 벌어들인 더러운 돈으로 화식을 노렸으니, 그 한 가지만으로도 포주인을 그냥 둘 수는 없었소. 포주인의 됨됨이가 당초부터 배리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문득 헤아려보아도 십 년 숙객이라 거래를 끊지 않고 범절 차려서 상종해 왔소. 그렇게 도둑의 와주 노릇으로 화식하여 장차 일향을 호령하고 호광을 누린다 한들 오래가진 못하오. 공명이나 분복이란 제 분수에 넘치면 필경 화를 입고 패가망신할 것이오. 지난겨울 우리 행중이 십이령길 눈보라와 매서운 한고에 시달리면서도 어물 도가의 신용이 어긋나지 않도록 물화를 여축없이 대어주지 않았소. 그때 포주인은 뜨끈뜨끈한 봉노에 엉덩이를 깔고 앉아 도둑의 장물을 팔아 화식을 노려 왔소. 그 장물이 도대체 뉘 것이오? 손톱으로 여물 썰듯 죽을 고생으로 연명하는 우리 상단의 것이 아니겠소.”

“적굴 놈들이나 장시에서 떠나지 않는 무뢰배들에게 혹간 소금 상단의 동정을 은밀히 귀띔해 달라는 위협을 받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등 두드리고 배 문질러서 몇 푼 찔러주며 돌려보내곤 하였지요. 뱀의 꼬리를 따라가면 대가리에 이르더라고, 행수가 이끄는 상단이 적굴 놈들에게 전대를 털리거나 멸구를 당하는 봉변을 당하면 시생의 어물 도가 역시 망조가 든다는 것을 슬기구멍이 꽉 막힌 놈이라 한들 깨닫지 못하겠습니까. 그들과 내통하다니…어림 반푼어치도 없는 얘깁니다. 내가 감옥에 갇혀서 섬거적을 뜯어먹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댁들에게 싸다듬이당할 죄가 없소이다. 대중없는 풍설을 믿고 사람 잡지 마시오.”
“아닌 보살 하는 것 보니…포주인이 미련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데? 미련하기가 몽둥이로 소를 몰겠소. 계집이 정절을 지켜야 계집의 구실 하듯 상인은 신의를 지켜야 고깃값을 하는 게요. 그래도 산적들과 내통하여 장물아비 노릇한 적이 없다고 버틸 작정이오? 패가망신한다는 말을 흰소리로만 들었소?”
“그걸 모를 턱이 있겠습니까. 내가 행수 일행과 안면을 싹 바꾸고 적굴 놈들을 상종하여 보비위나 일삼는 쓸개 빠진 놈인 줄 아시오? 내가 화적질을 방조했다면 이 자리에서 칼을 물고 엎어지겠소이다. 내 처신이 그토록 데데하게 보였소? 곤장(棍杖) 메고 매 맞으러 가더라고 시생이 쓸데없는 짓을 해서 화를 자초하겠소?”
듣고 보니 그럴싸한 얘기였다. 윤기호의 됨됨이를 모르는 사람은 그 하소연을 곧이듣고 눈물이 쑥 빠질 지경이었다. 포주인의 발명을 침통한 표정으로 듣던 정한조가 일행에게 손을 들어 보였다. 그들은 구석에 놓아두었던 작두를 포주인 앞에 대령하였다. 한 사람이 달려들어 그의 윗도리를 피나무 껍질 벗기듯 홀랑 벗겨버렸다. 그리고 그의 한 팔을 시퍼런 작두날 위에 올려놓았다. 물론 발버둥쳤으나 장골 두 사람의 완력을 뿌리칠 수 없었다. 작두날 사이에 한 팔을 올려놓자마자, 이때까지는 그나마 반정신은 남아 있던 그의 안색이 희미한 밤빛 속에서도 파리하게 가시는 듯했다. 순식간에 사시나무 떨듯 하는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던 정한조의 입에서 단호한 한마디가 흘러나왔다.
“열명길이 지척에 있소. 작두날에 팔 하나를 잃고 곰배팔이 되어 내성장시에서 쫓겨나겠소. 아니면 적당과 내통한 사실을 직토하여 그 꼴같잖은 허우대라도 온전하게 보전하겠소?”
2013-06-26 2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