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김주영 그림 최석운
“북새통 중에 우왕좌왕하다가 두령이란 놈을 등시색출 못 한 것은 큰 실책이었네. 뿐만 아니라 곳간도 찾아봐야 소용없네.”“땡추란 놈을 다시 한번 작신 두들겨서 추달을 해볼까요?”
“소용없는 일이야…… 곳간은 따로 있을 게야. 산채는 허울뿐이었네.”
“두령이란 놈이 순경 소임하던 자가 아닙니까?”
“척후로 십이령길을 수시로 들락거린 것은 틀림없으나, 궐자가 천봉삼이라면 죽지 못해 한 짓일 게야. 궐자의 내자와 피붙이가 산채에 인질로 잡혀 있었다네.”


먼산바라기 하던 계집의 얼굴에서 흘러내린 눈물이 동저고리 자락을 적시고 있었다. 일행은 발짝 떼어놓기조차 임의롭지 못한 잔당들을 이끌고 한나무재 계곡길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벌써 해가 지고 있었다. 지난번 곽개천 일행이 포자를 벌였던 밥자리에서 다시 화톳불을 피우고 야숙할 채비를 하였다.
“두령 행세하던 두 놈 중에 한 놈만 잡았으니, 밤을 낮 삼아 억죽박죽 뛰어다니고도 반타작밖에 못 한 꼴이군.”
두령 놓친 것이 못내 아쉬웠던 일행이 화톳불을 피우면서 그렇게 중얼거렸다.
“우리가 궐놈의 형용을 낱낱이 기억하고 있으니, 궐놈이 하늘로 솟거나 땅으로 꺼지지 않는 이상, 조만간 우리 손에 잡힐 테지. 너무 애간장 태우지 말게.”
정한조는 산채에서 데리고 온 계집사람을 화톳불 가로 가만히 불러 앉히고 구초도 받아낼 겸 지금까지 산채에서 살아오면서 겪은 이러저러한 사정들을 물었다.
“송파에서 떠나왔소?”
“예.”
“성씨는 뉘 댁이오?”
“저기 있는 외간의 남정네는 천봉삼이라 부르고 쇤네는 월이라 합니다.”
“그 산채에 인질로 잡혀간 지는 얼마나 되었소?”
“두 해 전입니다. 삼남으로 내려가면 살길을 찾겠거니 해서 무작정 발서슴하던 중에 무단히 십이령 고개로 접어들었습니다. 워낙 산중인데다가 밤낮없이 짐승들에 쫓기어 조도로 밀려나서 도무지 동서남북을 가릴 경황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시단이 되어 화적들과 마주쳤고, 그들은 우리 내외와 아이를 유리걸식하는 유민인 줄 알고 무작정 산채로 끌고 갔습니다. 산채의 세력을 불리자는 속셈이었겠지요. 우리 내외는 목숨 건진 것만 천만다행으로 생각하고 지금껏 연명해온 것이지요.”
“산채에 연고가 있었소?”
“연고라니요?”
“연고도 없는 적소에서 한 가솔이 고스란히 살아남았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소?”
“쇤네의 남정네가 지니고 있던 신표를 발견하여 송파의 행상인이란 것을 알아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암자를 삭도간(索道間) 삼아 염탐꾼으로 쓴다면 흥부장과 염전이며 십이령 소금 상단들의 사정을 소상하게 알아내어 적지 않은 이득을 얻을 것이란 생각을 가졌기에 부득불 살려둔 것이겠지요.”
“댁은 산채에서 양류밥이나 먹었소?”
“동자치였습니다.”
“송파에는 알음이 없소?”
“알음이 없지 않았으나, 하직하고 떠나오게 되었고, 척분도 두지 않았습니다.”
“쇠살쭈 노릇으로 송파 장시를 호령했다는 얘길 들었는데?”
“행수는 따로 있었지요. 쇤네의 남정네가 우연히 임오년 난리에 연루되어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다가 겨우 목숨을 보전하여 송파를 하직하고 살 붙이고 살 만한 길지를 찾는답시고 남쪽으로 발서슴하고 다녔습니다.”
2013-07-05 21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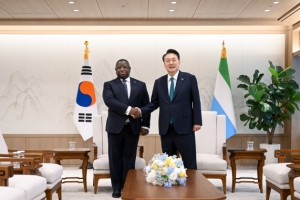










![전쟁·기후변화… 공멸해 가는 인류 깨우다[OTT 언박싱]](https://img.seoul.co.kr/img/upload//2024/02/16/SSC_20240216012138_N.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