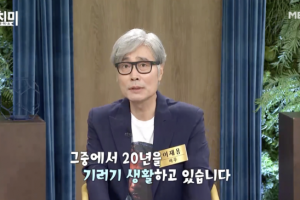‘체르노빌의 목소리’ 국내 출간
망각은 때로 편리한 도구가 된다. 과거의 아픔을 청산하고 미래를 대비하게 하는 정신의 건설적인 작용 차원에서 말이다.그러나 옛날의 아픔이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진행 중이고, 미래의 운명을 결정지을 만큼 치명적이라면 망각은 해악에 불과할 뿐이다.
대부분 망각의 늪으로 빠지곤 하는 아픔. 기억하고 싶지 않은 회피의 사실일 수도 있고 지우고 없애려는 의도적인 말살의 대상이기도 하다. 1986년의 ‘체르노빌 원전 사고’는 가공할 재앙의 두께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한 망각의 늪에 빠진 대표적 사례일 것이다. 그중에서도 단 한 기의 원전도 없었지만 체르노빌 원전 사고의 낙진을 고스란히 받아 지옥의 땅으로 변해 버린 인구 1000만명의 소국 벨라루스의 참상은 근래 발생한 아픔의 결정판이다.
그 체르노빌 원전 사고의 참상을 몸과 마음으로 고스란히 받아낸 벨라루스인들의 증언을 묶은 책이 국내에서 출간됐다. 벨라루스인 아버지와 우크라이나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여성 저널리스트가 발로 뛰어 기록한 ‘체르노빌의 목소리’(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 지음, 김은혜 옮김, 새잎 펴냄). 10년간 100인의 피해자를 추적해 기사체가 아닌 가감 없는 1인칭 고백으로 체르노빌 참상을 생생하게 전한다.
“아침에 정원에 나가니 벌이 한 마리도 없었소. 이튿날도, 그 다음날도 벌이 나타나지 않았소. 나중에야 원전 사고가 났다는 소식을 들었지. 우린 아무것도 몰랐소.”, “계속 죽고 갑자기 죽어요. 길을 가다가 쓰러져선 깨어나지 않고, 버스 정류장에 서 있다가 심장이 그대로 멎지요.” 영문도 모른 채 없어지고 죽어 가는 생명들을 그저 바라보아야만 했던 상실과 이별의 아픔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당신 앞에 있는 사람은 남편도, 사랑하는 사람도 아닌 전염성 높은 방사성물질일 뿐입니다.”, “갓 태어난 내 딸은 아기가 아니라 살아 있는 자루였다. 온몸이 구멍 하나 없이 다 막힌 상태였고 열린 것이라곤 눈뿐이었다.”
벨라루스는 원전 사고 후 국토의 23%가 방사성물질에 오염됐고 오염 지역 거주민 210만명 중 어린이가 70만명이며 방사능 피폭은 지금도 국민 주요 사망의 주원인이라고 한다.
많은 주민들은 “체르노빌식 죽음이 아닌 평범한 죽음을 맞고 싶다.”고 절규한다.
그럼에도 그런 참상은 그저 이름만으로 기억될 뿐이다. 그래서 저자는 책에 ‘미래의 연대기’라는 부제를 붙였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체르노빌을 겪은 인류는 핵 없는 세상을 향해 갈 것만 같았지만 우리는 아직도 체르노빌의 공포 속에서 살아간다.” “과거에 대한 책을 썼지만 그것은 미래를 닮았다.”는 저자의 말대로 ‘전쟁의 핵’과 ‘평화의 핵’은 쌍둥이일까.1만 6000원.
김성호 편집위원 kimus@seoul.co.kr
2011-06-11 2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