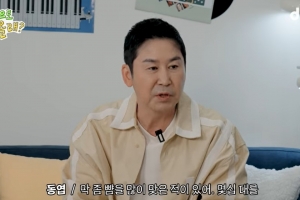자유시장경제와 결합한 관료제 “자기 이윤 뽑으려 온갖 규제 생산”
관료제 유토피아/데이비드 그레이버 지음/김영배 옮김/메디치미디어/360쪽/1만 9000원#1. “난 2016년부터 주립대학교의 등록금이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좋아요, 버니. 하지만 그 공짜 혜택에 대한 비용은 어디서 조달하죠?’ 난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월스트리트의 투기 행위에 대해 세금을 물릴 것이라고요.” (버니 샌더스 민주당 상원의원의 아이오와주 코커스 연설 중에서)
#2. 제임스 갈브레이스 텍사스대 교수 등 170명의 미국 경제학자들은 지난 19일(현지시간) “우리 경제학자들은 버니 샌더스 후보의 월스트리트 해체 공약이 ‘대마불사’(Too big to fail) 은행들이 불러올 또 다른 경제위기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샌더스 후보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버니 샌더스 공식 페이스북 캡처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버니 샌더스 공식 페이스북 캡처
버니 샌더스 공식 페이스북 캡처
자유 시장을 모토로 한 월스트리트는 역설적으로 미국 관료주의와 밀월 관계를 가진 공범으로 꼽힌다. 이 책의 저자이자 인류학자인 데이비드 그레이버 런던정경대(LSE) 교수가 현대 사회에 착근된 ‘뿌리 깊은 관료화’ 현상에 주목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신자유주의는 그 태생부터 19세기 이후 우리 머릿속에 새겨진 일종의 환상 같다. 자유로운 시장이라는 개념이 역사적으로는 군부대의 이동이나 공물 절취, 전리품 처리 등을 위한 정부 정책의 부산물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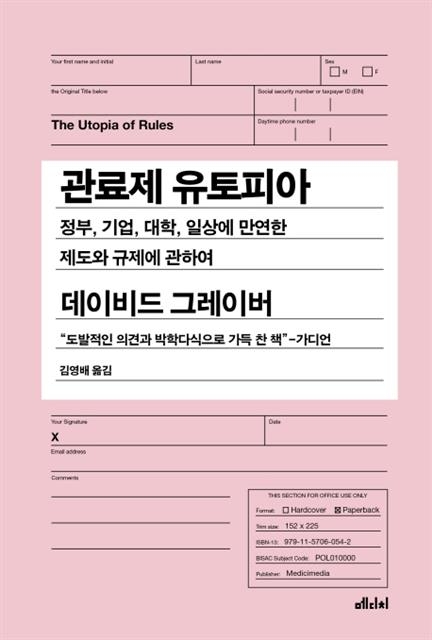

관료주의는 스스로 몸집을 불리기 위해 살아가는 조직처럼 보인다. 이는 정부나 대학에서 나타나는 어처구니없는 현상인 ‘너무 많은 위원회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위원회’ 창설 같은 것을 사례로 들 수 있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가 관료제와 결합하면서 이윤의 형태로 ‘부’(富)를 뽑아내기 위해 온갖 종류의 규제들을 마구 생산하고 있다는 게 저자의 지적이다.
그렇다고 ‘규제 철폐’에 대해 호의적이지도 않다. 관료주의적 간섭을 덜어내고, 각종 규칙을 줄여주는 의미의 규제 철폐가 아니라 실제로는 기업이나 정부 정책자들이 ‘자기 입맛에 맞는 방식’으로 규제의 구조 자체를 유리하게 바꾸는 눈속임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저자의 관료주의에 대한 시각은 냉소적이다. 관료주의가 왜 독창적인 사고방식을 경계하고 외면하는지를 파헤치면서, 나아가 우리 스스로가 관료주의에 매료되고 동조하는 조력자가 됐다고 분석한다. 갈수록 몸집과 영향력을 키우고 있는 관료주의에 대한 저자의 대안은 무엇일까. 관료주의를 혁신할 더 나은 세상에 대한 우리들의 더 나은 상상력을 답으로 제시한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2016-02-27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