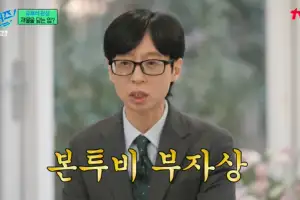시인 김지하(74) 선생이 서울대 문리대 미학과 학생이던 당시 한 신문을 통해 접한 판소리 명인 송흥록(1801~1863) 선생의 이 말은 김지하에게 수십 년간 지워지지 않는 큰 울림으로 다가왔다. 4일 정선에서 열린 ‘정선아리랑과 화랑도’라는 제목의 특강을 앞두고 원주 토지문화관에서 연합뉴스 기자와 만난 김 시인은 한마디로 정선아리랑에 ‘필이 꽂힌’ 느낌이었다.
“고교시절 시를 쓰고 그림을 그리는 등 어려서부터 예술에 관심이 많았다. 그래서 미학을 전공하게 됐고 4.19 직후 시대적 분위기에서 일본 강점기 때 말살 당한 민족문화, 특히 민중문화 민요를 공부해야겠다고 생각했지요”
전라도 판소리, 경상도 탈춤, 충청도 메나리 등 전국의 민요를 공부하고 있을 때 송 명인의 말은 신선한 충격이었고 이 가르침 때문에 이후 몇십 년 동안 가슴앓이를 했다고 털어놓았다.
“전남 목포서 태어나 전기기술자이던 부친을 따라 13살 때 강원도 원주로 이사하고 고향에 대한 향수와 소리에 대한 자부심으로 판소리 공부에 몰두해왔는데, 민족문화의 미학적 근원이 내가 사는 강원도 정선이라니…”
당시의 충격과 감동을 김 시인은 이렇게 설명했다. “그러나 내가 20살이던 당시는 당장 그럴(정선아리랑을 공부할) 형편이 못됐어” 반체제 저항시인으로 파란만장하게 살아온 시대의 아픔을 한마디로 줄였다. 그러다 어느 정도 건강이 회복되면서 5~6년 전부터 정선을 찾아나섰다. 아우라지, 동강, 정선 5일장, 백두대간 등과 정선아리랑 자료를 찾느라 정선군청도 셀 수 없이 드나들었다.
“그러고는 우리 민족의 미학적 본질이 정선아리랑이라는 송 명인의 말에 확신을 하게 됐어요. 남북통일에 필요한 민요적 동질성을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그는 4일 정선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아리랑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3주년 기념 명사 초청 특강에서 “정선아리랑의 비밀인 시김새는 시커먼 절망에서 하얀 희망을 떠올리는 노래”라고 말했다. 또한 “아리랑은 세계와 인류를 평화 속에 화해시키고 우리 민족을 통일시키고 함께 들어 올릴 역사적 기원”이라고 강조했다.
수능을 마친 고3 수험생을 비롯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이날 강연에서 그는 “이제부터 여러분은 서로 모여서 어떤 동의에 도달할 때 주먹을 모아쥐고 ‘파이팅!’ 하지 말고 미소지으며 ‘아리랑’하시길 바란다”고 권했다.
한편 김 시인은 지난 1970년 ‘오적 필화사건’으로 구속됐다 풀려난 데 이어 1974년에는 민청학련 사건으로 사형선고를 받는 등 투옥과 출옥을 반복하며 문학활동을 이어왔다. 지난 1991년에는 대학생 강경대 씨가 경찰에게 맞아 숨지고 이에 항의하는 분신자살이 잇따르자 ‘죽음의 굿판을 걷어치우라’라는 글을 써 진보진영으로부터 ‘변절자’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