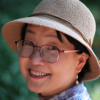‘과거사 물타기’ 비관적 전망속 우리 정부 막판 ‘결단’ 촉구
향후 한일관계의 가늠자가 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행보가 29일 미국 워싱턴DC에서 펼쳐진다.아베 총리는 이번 방미기간 최대 하이라이트인 미 상하원 합동연설을 우리 시간으로 이날 자정 직전 미 하원 본회의장에서 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로서는 당연히 아베 총리가 식민지배와 침략,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과거사에 대해 어느 수준의 역사인식을 표명할지에 대해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한일관계가 앞으로도 갈지자 행보를 계속할지, 관계개선을 위한 모멘텀을 마련할 수 있을지 이날 발언이 방향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26일부터 시작된 방미 일정에서 아베 총리가 보여준 태도에 비춰 낙관적 기대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아베 총리는 하버드대 공공정책대학원 강연, 알링턴국립묘지 참배, 홀로코스트 박물관 방문, 미일 정상회담 등 일련의 기회에 진정한 사과와 사죄의 뜻은 밝히지 않으면서 “가슴이 아프다” “깊은 고통을 느낀다” 등의 표현으로 교묘히 계산된 ‘과거사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여전히 주체를 생략한 채 ‘인신매매’(human trafficking)라는 표현으로 핵심을 비켜갔으며, 심지어 “전쟁 중에 여성의 인권이 종종 침해당해 왔다”며 이 문제를 전시의 문제로 일반화하려는 듯한 언급도 했다.
우리 정부는 아베의 입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한편, 막판까지 “전 세계의 이목이 지금 아베 총리를 향해 있다”(윤병세 장관)면서 아베 총리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아베 총리의 연설이 ‘역시나’로 끝났을 경우 한일관계는 더욱 냉기류가 흐르면서 관계개선도 험난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과거사에 대해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안보, 경제 등 상호 호혜적 분야에서는 협력하는 투트랙 기조를 취하고 있지만, 과거사 부문에서 진전이 없으면 투트랙 기조도 근본적으로 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우려스러운 것은 아베 총리의 이번 방미를 계기로 한일간 과거사 문제가 뒷전으로 밀려날 가능성이다.
미일은 양국은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확정과 ‘과거의 적’에서 ‘부동의 동맹(unshakeable alliance)’으로 관계를 재정립, 역내에서 중국에 대한 견제를 더욱 강화할 태세다.
이에 따라 일본은 미국도 미래를 강조하며 과거사의 깨끗한 정리를 요구하는 한국의 목소리에 귀를 닫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미관계 마찰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미국은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이 유엔 안보리 개혁을 통해 상임이사국이 되는 것을 기대한다”고 밝힌 것도 한미 간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다.
우리 정부는 상임이사국 확대를 주장하는 일본의 안보리 개혁안에 반대하고, 비상임이사국 증설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의 외교력이 심각한 검증대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미일 가이드라인과 아베 총리의 방미기간 행보 등을 언급하며 “우리 정부의 대일, 대미 외교 전략부재와 실패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정부에 외교정책의 수정 보완을 촉구할 뜻임을 밝혔다.
정부가 이미 일각에서 제기된 ‘외교 실패’, ‘외교적 고립’ 비판에 시달리는 가운데 아베 총리의 미 의회연설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이 같은 비판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가 최근 반둥연설에 이어 미 의회연설에서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정부는 다시 8월로 예상되는 종전 70주년 연설(일명 아베 담화)로 표적을 옮길 것으로 보인다.
과거사를 사죄하기에는 종전 70주년 아베 담화가 갖는 상징성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베 총리가 반둥연설에 이어 미 의회연설까지 비켜가면 아베 담화에 대한 기대도 더욱 현실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현재 국장급에서 협의가 진행 중인 일본군 위안부 협상에서 돌파구 마련을 시도하는 한편, 한중일 외교장관회담에서 ‘편리한 가장 빠른 시기’에 개최키로 합의한 3국 정상회담을 통해 일본의 태도변화를 위한 분위기 전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