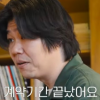1955년 12월 박헌영 처형 대내외 공개
광복 이후 북한 정권 수립 이래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 가문의 친인척 중에서 사형 사실이 공개된 인물은 장성택이 유일무이하다.또 김일성 주석으로부터 이어진 3대의 1인 지배체제 확립 과정에서 숙청되고 처형된 고위 인사들은 꽤 많았지만, 이번처럼 사형 집행을 대대적으로 공개한 적은 1950년대 박헌영을 필두로 한 남로당계 처형 이후 극히 이례적이다.
김 주석은 6·25 남침 실패로 정치적 입지가 불안해지자 1952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고 ‘소련파’인 박창옥 등을 내세워 남로당계 인사들에게 그 책임을 뒤집어씌웠다.
북한은 이듬해인 1953년 8월 남로당계 숙청 재판을 열고 남로당계 2인자였던 이승엽을 ‘미제의 간첩’으로 몰아 먼저 처형했으며 1955년 12월에는 남로당계 수장인 박헌영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
당시 북한은 박헌영의 재판 기록까지 책자로 만들어 배포했다.
김 주석에 이어 북한의 2인자였던 박헌영에게 적용된 혐의는 반당 종파분자·간첩 방조·정부전복 음모 등으로 장성택의 혐의와 비슷했다.
당시 북한은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은 북한 주민들의 불만, 구소련과 중국 등 6·25전쟁을 지원했던 우방국을 의식해 남로당계 인사들에 대한 사형 집행 사실을 대내외에 공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북한은 1956년 8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계기로 ‘연안파’와 소련파를 숙청하고 연안파 거두 최창익과 소련파 거두 박창옥을 사형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들을 지원하던 중국과 구소련의 입장을 고려해 사형 집행을 공개하지 않았다.
오히려 당시에는 불안한 정국을 이용해 관련 인사들이 러시아와 중국으로 망명할 수 있었다.
1967년 숙청된 ‘갑산파’의 우두머리 박금철과 김도만·리효순 등도 사형됐다는 공식보도는 없었다. 사실 이들은 ‘종파분자’였을 뿐, 간첩이나 국가전복 음모 등의 혐의가 적용되지는 않았던 것이다.
공개 처형은 김정일 체제 들어 가장 많이 이뤄졌지만 역시 사형 사실을 공개한 적은 없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19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으로 수백만의 아사자가 발생하고 주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자 그 책임을 서관히 전 노동당 농업담당 비서에게 넘겨씌웠다.
서관히가 6·25전쟁 당시 미제의 간첩으로 고용됐고 이후 당의 ‘주체농법’을 체계적으로 방해해 북한의 식량문제를 위기로 몰아갔다며 1997년 평양시민이 보는 앞에서 그를 공개처형했다.
이후 서관히 간첩사건을 시작으로 3년간 북한 전역을 광풍에 몰아넣은 ‘심화조사건’을 총지휘한 채문덕 당시 사회안전부 정치국장은 2000년 “당의 일심단결을 파괴한 간첩”으로 몰려 처형됐다.
북한 당국은 대량 아사자 발생과 심화조사건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고자 서관히와 채문덕에 대한 사형 집행을 주민 강연회나 내부 유선방송인 ‘3방송’을 통해 전역에 공개했다.
그러나 당시에도 이번과 같이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통신 등 공식매체를 통해 사형 집행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2010년 3월 화폐개혁 실패의 책임을 지고 총살한 박남기 전 노동당 계획재정부장이나 2011년 초 간첩죄로 처형된 류경 전 국가안전보위부 부부장의 사형 집행 역시 비공개로 진행했다.
연합뉴스



























![전쟁·기후변화… 공멸해 가는 인류 깨우다[OTT 언박싱]](https://img.seoul.co.kr/img/upload//2024/02/16/SSC_20240216012138_N.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