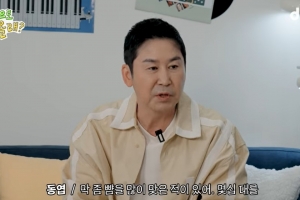광복 직후부터 60여년간 서울 종로 피맛골 선술집 골목의 한 자리를 변함없이 지켜오다 재개발 사업으로 할 수 없이 이사하게 된 ‘청일집’이 지금의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문을 연 5일 밤 9시께.
역사의 한 페이지로 사라지기 전 이곳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려는 손님 70여명으로 1ㆍ2층 20여개 테이블이 발 디딜 틈 없이 꽉 들어찼다.
10개의 막걸리 상자는 영업시간이 한참 남았는데도 벌써 동이 나 텅텅 비었고, 문 앞까지 일행이 바글바글해 음식을 나르는 아주머니가 걸음을 떼는데 애를 먹었다.
주인 임영심(61.여)씨는 혼자 통유리 앞에 서서 익숙한 손놀림으로 한 손에 뒤집개를 들고 빈대떡을 6장씩 빠르게 부쳐나갔다. 정오부터 밤 9시까지 혼자 전을 부치면서 물 한 모금 마실 새 없이 바빴지만 밀려드는 주문에 손놀림은 여전히 활기찼다.
“한 잔 드시게!”
1층 테이블에 앉은 이재범(60)씨가 막걸릿잔을 들고 초면의 옆 자리 일행에게 건배 제의를 하자 이내 “예, 형님!”하는 친숙한 답변이 돌아온다.
같은 시점 옆 자리에 앉은 이들끼리 빈대떡을 주고 족발을 건네받는 장면이 눈에 들어왔다. 이곳에선 연배가 달라 보이는 두쌍의 부부가 즉흥적으로 동석을 결정하는 등 낯선 이들이 금세 친구가 되는 것이 ‘일상’의 풍경이다.
이씨는 “1968년 고등학생 시절 선생님 모르게 여기 와서 빈대떡 먹고 땅에 묻은 독에서 떠준 막걸리를 마시고 그랬다”며 “역사가 서린 곳을 하루아침에 없앤다니 기분이 좋지 않다”고 속상해했다.
마지막 날을 함께 하려고 2년 만에 이곳을 찾은 단골 이순신(67)씨는 “어리굴젓 맛이 아주 끝내주는데다 서민들이 모이는 집이라 좋았다”며 “이 집을 현대적인 건물에 옮겨 놓는다니 예전 같지 않을 것 같다”고 아타까워했다.
빈대떡을 앞에 둔 이들은 곳곳에서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 여기를 잊고 살았다”는 ‘고해성사’를 뱉어냈고 “박정희 대통령 시절 여기서 ‘이념송’을 부르다 시끄럽다고 어른들한테 쫓겨났다”고 옛 추억을 더듬기도 했다.
그동안 소문으로만 듣다가 마지막이 못내 아쉽다며 이날 처음으로 청일집에 발길을 준 이들도 있었다.
아내, 처제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던 김철호(40)씨는 “라디오에서 여기가 오늘 문을 닫는다기에 찾아왔는데 한 시간을 기다려서 겨우 자리를 잡았다”며 벽의 낙서를 보니 대학 때 추억도 생각나 향수가 들었다”고 했다.
시아버지가 광복 직후부터 운영하던 식당을 물려받아 40년 넘게 청일집을 지킨 주인 임씨는 “빈대떡 집에 시집온 걸 원망했는데 이렇게 좋은 손님들을 많이 만나서 여기서 보낸 시간이 정말 감사했다”며 청일집과 함께한 세월을 고마워했다.
골목을 떠나니 아쉽지 않느냐는 질문엔 “내가 아쉽기보다 손님들이 더 아쉽겠지 뭐”라고 너스레를 떨면서도 “맷돌, 길 간판, 집기, 식기뿐만 아니라 맛도 그대로 가지고 갈 것”이라는 말로 서운함을 달랬다.
청일집의 마지막을 함께 한 손님들은 오후 11시에 피맛골의 마지막 선술집이 문을 닫을 때까지 ‘역사가 있는 곳에서 역사를 마시고 간다’, ‘총각 때 옛 기억을 회상한다’ 등의 낙서로 벽을 빽빽이 메우고서야 겨우 아쉬운 발걸음을 뗐다.
연합뉴스
역사의 한 페이지로 사라지기 전 이곳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려는 손님 70여명으로 1ㆍ2층 20여개 테이블이 발 디딜 틈 없이 꽉 들어찼다.
10개의 막걸리 상자는 영업시간이 한참 남았는데도 벌써 동이 나 텅텅 비었고, 문 앞까지 일행이 바글바글해 음식을 나르는 아주머니가 걸음을 떼는데 애를 먹었다.
주인 임영심(61.여)씨는 혼자 통유리 앞에 서서 익숙한 손놀림으로 한 손에 뒤집개를 들고 빈대떡을 6장씩 빠르게 부쳐나갔다. 정오부터 밤 9시까지 혼자 전을 부치면서 물 한 모금 마실 새 없이 바빴지만 밀려드는 주문에 손놀림은 여전히 활기찼다.
“한 잔 드시게!”
1층 테이블에 앉은 이재범(60)씨가 막걸릿잔을 들고 초면의 옆 자리 일행에게 건배 제의를 하자 이내 “예, 형님!”하는 친숙한 답변이 돌아온다.
같은 시점 옆 자리에 앉은 이들끼리 빈대떡을 주고 족발을 건네받는 장면이 눈에 들어왔다. 이곳에선 연배가 달라 보이는 두쌍의 부부가 즉흥적으로 동석을 결정하는 등 낯선 이들이 금세 친구가 되는 것이 ‘일상’의 풍경이다.
이씨는 “1968년 고등학생 시절 선생님 모르게 여기 와서 빈대떡 먹고 땅에 묻은 독에서 떠준 막걸리를 마시고 그랬다”며 “역사가 서린 곳을 하루아침에 없앤다니 기분이 좋지 않다”고 속상해했다.
마지막 날을 함께 하려고 2년 만에 이곳을 찾은 단골 이순신(67)씨는 “어리굴젓 맛이 아주 끝내주는데다 서민들이 모이는 집이라 좋았다”며 “이 집을 현대적인 건물에 옮겨 놓는다니 예전 같지 않을 것 같다”고 아타까워했다.
빈대떡을 앞에 둔 이들은 곳곳에서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 여기를 잊고 살았다”는 ‘고해성사’를 뱉어냈고 “박정희 대통령 시절 여기서 ‘이념송’을 부르다 시끄럽다고 어른들한테 쫓겨났다”고 옛 추억을 더듬기도 했다.
그동안 소문으로만 듣다가 마지막이 못내 아쉽다며 이날 처음으로 청일집에 발길을 준 이들도 있었다.
아내, 처제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던 김철호(40)씨는 “라디오에서 여기가 오늘 문을 닫는다기에 찾아왔는데 한 시간을 기다려서 겨우 자리를 잡았다”며 벽의 낙서를 보니 대학 때 추억도 생각나 향수가 들었다”고 했다.
시아버지가 광복 직후부터 운영하던 식당을 물려받아 40년 넘게 청일집을 지킨 주인 임씨는 “빈대떡 집에 시집온 걸 원망했는데 이렇게 좋은 손님들을 많이 만나서 여기서 보낸 시간이 정말 감사했다”며 청일집과 함께한 세월을 고마워했다.
골목을 떠나니 아쉽지 않느냐는 질문엔 “내가 아쉽기보다 손님들이 더 아쉽겠지 뭐”라고 너스레를 떨면서도 “맷돌, 길 간판, 집기, 식기뿐만 아니라 맛도 그대로 가지고 갈 것”이라는 말로 서운함을 달랬다.
청일집의 마지막을 함께 한 손님들은 오후 11시에 피맛골의 마지막 선술집이 문을 닫을 때까지 ‘역사가 있는 곳에서 역사를 마시고 간다’, ‘총각 때 옛 기억을 회상한다’ 등의 낙서로 벽을 빽빽이 메우고서야 겨우 아쉬운 발걸음을 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