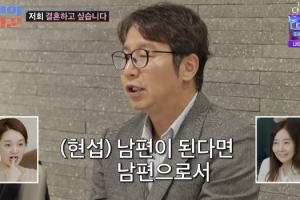MB정부 때 ‘자주개발률’ 목표 강요
최근 검찰의 자원외교 비리 수사 대상이 된 한국석유공사가 무분별하게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벌였던 것은 이명박(MB) 정부의 ‘자주개발률’ 목표 할당 때문이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민간기업에 대한 성공불융자 지원 규모의 대폭 확대도 이때 추진됐다. 자주개발률은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개발·확보한 자원을 나타내는 지표로, 일부 논란에도 불구하고 에너지공기업 평가의 주요 지표로 활용됐다.20일 석유공사 등에 따르면 국가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해 비축사업 중심으로 운영되던 석유공사는 2008년 ‘석유공사 대형화 방안’ 시행 이후 ‘공격적인’ 해외 개발사업 중심으로 재편된다. 2007년 3조 5000억원, 전체 자산의 27% 정도에 불과했던 석유공사의 개발자산은 2013년 22조 6000억원, 전체 자산의 79%까지 급증했다. 이 때문에 2008~2013년 전체 자산은 13조원에서 28조 8000억원으로 불어나고, 석유·가스 부문 자주개발률도 6%에서 14%로 껑충 뛰었다. 하지만 부채 또한 5조 5000억에서 18조 5000억원으로 급증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했다.
해외자원 개발의 최대 실패작으로 평가되는 2009년 하베스트 인수 건의 경우 이라크 등 중동으로부터 원유를 운송하는 것보다 운송료가 배럴당 7달러나 더 비싸다는 기본적인 결점도 파악하지 못한 채 추진됐다. 결국 매입 이후 현재까지 손실액만 1조 7000억원에 이른다. 베네수엘라 오나도 광구나 중국 닝샤(寧夏)자치구 마황산(麻黃山) 서광구 사업 역시 해당국 국내법에 ‘국가는 자원의 독점적 소유자’로 규정된 사실을 간과했다. 막대한 국고 사업의 주체가 사실상 ‘왕초보’였던 셈이다.
이 같은 ‘묻지마 투자’의 배경으로는 공기업 평가를 무기로 ‘실적’(자주개발률)을 강요한 MB정부가 꼽힌다. 당시 민간기업의 해외 자원개발 참여 역시 꾸준히 독려됐다. 해외 석유가스 개발사업 참여 민간기업은 2007년 56곳에서 2008년 76곳, 2009년 86곳으로 늘었다. MB정부 시절 자원개발 신청 업체의 98%가 지원대상으로 선정돼 ‘눈먼 돈’으로 인식됐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런 해외 자원개발 사업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지난 1월 감사원은 석유공사 감사 결과를 통해 “자주개발률 제고 분위기와 맞물려 단기간 생산물량 목표 달성에 치중해 재정건전성·수익성이 악화됐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5-03-21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