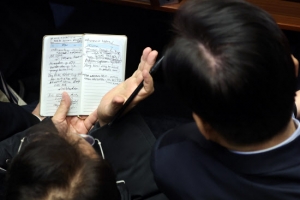메르스 사투 최전선… 국립중앙의료원 간호사들의 24시
매일 착용하는 방호복 무게만큼이나 감염에 대한 두려움과 누적된 피로가 시시각각 온몸을 짓누른다. 방호복을 입은 채 병실에서 사투를 벌인 지 어느새 한 달,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를 이겨내겠다는 생각과 같이 고생하는 동료들을 위안 삼아 버티고 또 버티는 시간들이 이어진다.

격리병동 비상 근무
국립중앙의료원 의료진이 19일 음압시설을 갖춘 격리병동에서 메르스 환자를 돌보고 있다. 메르스 중앙 거점 병원으로 지정된 의료원은 확진자와 의심환자 등 19명의 치료를 전담하고 있다.
서울 중구 을지로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근무하는 정은숙(53) 간호사는 동료 의사 100여명, 간호사 300여명과 함께 매일같이 메르스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메르스 중앙 거점 병원으로 지정된 의료원은 첫 번째 환자(68)를 포함해 현재 19명(의심환자 7명 포함)을 전담으로 치료하고 있다.
종전에는 3교대 정시근무 체제로 움직였으나, 메르스 환자가 들어온 뒤에는 비상상황이 이어져 길게는 하루 18~19시간 긴장감 속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하루 일과는 새벽 5시30분쯤 의료원 5~8층에 있는 격리병동에 출근해 방호복을 입는 것으로 시작한다. 기도 삽관을 하거나 가래를 뽑는 치료 등을 할 때는 침방울이 공기 중에 퍼지는 현상인 에어로졸이 발생할 수 있어 양압기가 달린 C등급 방호복을 입는다. 방호복을 입는 데만 10분 넘게 걸리지만, 병실로 들어서기 위해서는 덧신과 장갑도 이중으로 껴야 한다. 19일 취재차 의료원을 찾은 기자에게 정 간호사는 “한 번 착용한 보호복은 사용 이후 버려야 하기 때문에 보통 2~3시간 정도 병실 내에서 필요한 모든 일을 한다.”고 말했다. 방호복을 입은 채 투약, 주사, 병실 내 소독 등을 하고 나면 속옷까지 땀으로 범벅된다. 방호복은 공기 순환이 안 되는 데다 C등급의 경우 양압기와 방호복 무게가 8~9㎏에 이른다. 병동에는 의료진 외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환자 식사나 오물 처리도 이들의 몫이다.
그렇게 업무를 마치고 나오면 가장 위험한 순간이 찾아온다. 방호복을 벗을 때는 입을 때보다 2배 정도 시간이 더 걸린다. 정 간호사는 “이중으로 된 덧신과 장갑, 오염물질이 가장 많이 묻을 수 있는 앞치마를 벗을 때는 자칫 순간의 방심이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고 전했다. 신수영 간호사는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업무에 임하고 있지만, 의료진에게도 감염은 당연히 두려운 일”이라고 귀띔했다.
지금까지 전국 병원에서 메르스를 치료하다 감염된 의료진이 30명에 이르면서 감염 공포가 크지만, 그에 못지않게 주변의 시선도 두렵다고 했다. 정 간호사는 “잠깐 집에 들를 때는 의료진을 감염 덩어리처럼 보는 따가운 시선 때문에 병원에서 훨씬 떨어진 곳에서 택시를 타는 의료진도 있다”며 “학교에서는 아이와 떨어져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엄마가 의료기관에 다닌다는 이유 만으로 아이의 체온을 수시로 측정하기도 한다”고 안타까워했다.
●의료진 상당수 집에 못 가고 ‘병원살이’
의료진 가운데 지난달 20일 최초 환자 발생 이후 단 한 번도 집에 가지 못한 의료진이 상당수다. 자녀가 있는 간호사는 혹시나 바이러스를 옮길까 하는 우려에서 아예 병원 내 숙소에서 생활하거나 아이를 친정이나 시댁에 맡긴 경우가 많다. 사스, 신종플루 등과 비교해 어느 때보다 사태가 길어지고 있지만 이들은 “사명감으로 무장해 치료에 집중하면 메르스를 이겨낼 수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06-20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