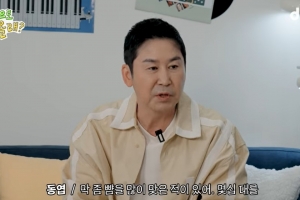격의없는 이승엽, 후배와 가볍게 대화하며 묵직한 조언
처음 ‘국민타자’ 이승엽(40·삼성 라이온즈)과 눈을 마주치면 후배들은 순간 ‘얼음’이 된다.이제 막 프로 생활을 시작한 신인이라면 더 그렇다.
이승엽은 자신보다 21살이나 어린 신인 최충연(19)에게 “형이라고 불러봐”라고 장난을 걸었다.
최충연이 태어난 1997년, 이승엽은 32홈런을 치며 생애 첫 홈런왕에 올랐다.
최충연은 ‘국민타자’라고 불리는 대선배의 장난에 쭈빗거리다 “형”이라고 불렀다.
물론 이후에는 ‘선배님’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이런 장난이 이승엽과 최충연은 ‘동료’로 묶였다.
이승엽을 보며 야구 선수 꿈을 키운 젊은 후배들에게 이승엽은 너무나 큰 존재다.
그러나 이승엽의 계속된 농담에 경직됐던 몸과 마음이 녹아내린다.
이승엽은 후배들에게 ‘국민타자’나 ‘우상’이 아닌 ‘형’이 되려 한다.
그는 “그냥 가벼운 농담 수준”이라고 하지만 이승엽이 건네는 한 마디 한 마디는 후배들 가슴에 깊이 박힌다.
17일 일본 오키나와 온나손 아카마 구장에서 만난 이승엽은 수시로 후배들에게 대화를 나누며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이승엽은 “기술적인 조언을 하는 건 아니다. 나도 후배들과 같은 곳에서 뛰는 야구 선수에 불과하다”라고 손을 내저으며 “내가 1군에서 생활하며 느낀 걸 얘기하는 정도다”라고 말했다.
가볍게 한 마디 한 마디를 툭툭 던지지만, 묵직한 메시지가 담겼다.
이승엽은 “모든 후배가 야구를 잘했으면 좋겠다. 특히 1, 2군을 오가는 선수들이 확실하게 올라왔으면 한다”며 “어린 선수를 보면 옛 생각이 난다. 그리고 이런 조언이 떠오른다. ‘야구를 잘하면 좋은 대우를 받고 행복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내 역할인 것 같다”고 했다.
한국프로야구에서 이승엽은 늘 정상에 있었다.
일본에 진출해서도 리그를 대표하는 요미우리 자이언츠 4번타자로 뛰는 등 대단한 활약을 했다.
그러나 부상과 부진으로 2군 강등의 쓴맛도 봤다.
이승엽은 “나도 일본에서 힘든 시기를 보냈다. 2군에 있으면 ’정말 힘들다‘라는 생각이 든다”며 “1, 2군을 오가는 선수들도 ’어떻게든 1군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의식이 뇌와 몸에 박혀 있어야 한다”고 했다.
물론 이승엽의 조언은 말로 끝나지 않는다.
누구보다 성실하게 훈련하고, 나이를 잊은 경기력으로 후배에게 ’살아 있는 교과서‘ 역할을 한다.
이번 스프링캠프도 순조롭게 소화하고 있다.
이승엽은 “어릴 때는 스프링캠프부터 좋은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부담이 있었지만, 지금은 개막전 첫 타석에 목표를 두고 훈련하면 된다”면서도 “지금 몸 상태가 좋다. 생각했던 것보다 잘되고 있다. 후회 없이 훈련하자는 마음으로 스프링캠프를 소화한다”고 했다.
그는 “모든 선수가 실력 향상을 목표로 스프링캠프를 치른다. 프로 선수니까 지난해보다 나은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프로는 단점을 장점으로 바꿔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승엽은 2015시즌을 마치고 2년 36억원에 FA(자유계약선수) 계약을 했다.
2년 뒤, 이승엽은 은퇴할 계획이다.
그는 “은퇴 시점을 정해놓으니 한 경기, 한 타석을 더 소중하게 느낀다”며 “’후회 없이 해보자'는 생각이 더 강해졌다”고 말했다.
후회하지 않고자 스프링캠프에서 땀을 쏟는 국민타자의 모습에 후배들은 큰 깨달음을 얻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