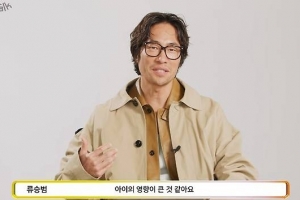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복지제도인 개별급여체계로 손질하더라도 수혜 대상자가 많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목희(민주당) 의원은 17일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안을 분석한 결과 기초생활보장급여 수혜자의 확대 효과가 작아 맞춤형 복지제도의 의미가 퇴색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개별급여체계 전환을 통해 수혜 대상자가 확대되는 것은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두 분야다.
이 의원은 “기초생활보장 재정의 대부분을 의료·생계급여가 차지해 주거·교육급여 수혜자가 늘어나더라도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 자료에 따르면 현재 생계급여 소요 예산은 2조4천677억원이지만, 개별급여로 전환하면 현행보다 6천453억원 줄어든 1조8천223억원의 예산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차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맹점으로 지적받아온 부양의무자의 범위가 줄어들지 않았다는 점과 수급 기준을 장관이 정하도록 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 의원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준을 최저생계비가 아닌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소득인정액으로 바꾸는 것은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정부의 재량급여로 전락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맞춤형 복지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뜯어고치기로 하고 이른바 ‘통합급여’에서 수급자 개개인의 형편에 맞춘 ‘개별급여’로 급여지급 방식을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간 수급자는 수급자 선정 기준을 통과해 일단 수급자가 되기만 하면, 생계비부터 시작해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출산비, 장례비 등 모두 7가지에 이르는 급여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었다. 하지만, 이 기준을 넘지 못하거나 비록 기준을 통과해 수급자가 되었더라도 나중에 형편이 나아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수급자에서 자동 탈락해 모든 급여혜택을 받을 수 없는 처지로 빠졌다.
이 때문에 저소득층은 어떻게든 수급자가 되거나 수급자로 계속 남아 있으려 시도하거나, 일할 능력이 있는데도 근로소득을 올리려고 하지 않는 등 부작용을 낳았다. 이 제도가 수급자의 소득이 늘수록 급여혜택은 줄어드는 방식이다 보니,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라도 일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수급자 개인별로 각자의 사정에 맞춰 급여별 선정기준을 별도로 마련해 생계비가 필요하면 생계비를, 의료비가 필요하면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쪽으로 급여제공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연합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목희(민주당) 의원은 17일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안을 분석한 결과 기초생활보장급여 수혜자의 확대 효과가 작아 맞춤형 복지제도의 의미가 퇴색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개별급여체계 전환을 통해 수혜 대상자가 확대되는 것은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두 분야다.
이 의원은 “기초생활보장 재정의 대부분을 의료·생계급여가 차지해 주거·교육급여 수혜자가 늘어나더라도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 자료에 따르면 현재 생계급여 소요 예산은 2조4천677억원이지만, 개별급여로 전환하면 현행보다 6천453억원 줄어든 1조8천223억원의 예산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차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맹점으로 지적받아온 부양의무자의 범위가 줄어들지 않았다는 점과 수급 기준을 장관이 정하도록 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 의원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준을 최저생계비가 아닌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소득인정액으로 바꾸는 것은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정부의 재량급여로 전락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맞춤형 복지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뜯어고치기로 하고 이른바 ‘통합급여’에서 수급자 개개인의 형편에 맞춘 ‘개별급여’로 급여지급 방식을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간 수급자는 수급자 선정 기준을 통과해 일단 수급자가 되기만 하면, 생계비부터 시작해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출산비, 장례비 등 모두 7가지에 이르는 급여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었다. 하지만, 이 기준을 넘지 못하거나 비록 기준을 통과해 수급자가 되었더라도 나중에 형편이 나아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수급자에서 자동 탈락해 모든 급여혜택을 받을 수 없는 처지로 빠졌다.
이 때문에 저소득층은 어떻게든 수급자가 되거나 수급자로 계속 남아 있으려 시도하거나, 일할 능력이 있는데도 근로소득을 올리려고 하지 않는 등 부작용을 낳았다. 이 제도가 수급자의 소득이 늘수록 급여혜택은 줄어드는 방식이다 보니,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라도 일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수급자 개인별로 각자의 사정에 맞춰 급여별 선정기준을 별도로 마련해 생계비가 필요하면 생계비를, 의료비가 필요하면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쪽으로 급여제공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