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대 대학가에 ‘관보 대학생’이란 말이 등장했었다. 대학들이 정원을 초과해 신입생을 뽑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문교부가 “관보에 정원 내 학생 명단을 싣겠다”고 밝히자 이를 빗대 유행했던 용어이다. 이른바 ‘학사등록제’인 셈이다. 이후 문교부는 전국 대학의 재적생 현황 파악에 나섰고, 청강생 등 잉여 학생은 무려 3만여명이나 됐다고 한다. 교육 행정의 난맥상으로 인해 대학생 명단까지 관보에 실렸다니 먼 옛날의 이야기다.
관보(官報)는 말 그대로 정부에서 발행하는 기관지이다. 법령 개정과 부처 의결사항, 인사, 공고가 여기에 실린다. 내용이 난해하지만 그 시대의 정치와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첫 관보로는 조선 태조(1392년) 때 예문춘추관에서 발행한 ‘조보’(朝報)를 친다. 이후 1894년(고종 31년) ‘대한제국관보’란 제호로 발행되다가 정부수립 해인 1948년부터 ‘대한민국관보’라는 이름으로 맥을 잇고 있다. 관보는 왕조시대 길거리에 써 붙였던 방(榜)과도 궤를 같이한다. 세종실록에는 ‘대소 인원들이 그해(1429년)의 수교(受敎)한 것을 알지 못하여 범법한 자가 자못 많으니 금령조목(禁令條目)을 줄여 줄 친 게시판을 만들어 광화문 밖 등의 장소에 걸어 알려주게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이처럼 60여년을 이어온 근대식 ‘종이 관보’가 좀체 보기 힘들어졌다. 지난 2000년 10월 전자관보시대를 열면서 병행해 발행되다가 지금은 딱 11부만 인쇄된다. 국가기록원 3부 외에 국회도서관, 법제처, 헌법재판소 등 8군데에 1부씩만 들어간다. 청와대에서도 종이 관보를 못 보는 정도이니 귀하디귀한 몸이다.
관보에 관한 뒷얘기는 더러 전해진다. 정부는 일반인이 알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민감한 사안은 관보에만 슬쩍 넣고 숨기려는 꼼수를 쓰기도 했다. 부지런하고 눈치 빠른 기자들은 기자실에 비치된 관보에서 특종을 낚아채기도 했다. 숨기려는 의도만큼 사회적인 파장은 컸다. 관보는 요즘에도 논란의 중심에 선다. 최근 청와대에서 비서관급 인사를 관보에만 싣겠다고 하자 ‘관보 인사’란 비아냥을 듣고 있다. 최근 암으로 사망한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대통령이 병석에서 서명한 관보가 공개되자 그의 건강 상태를 놓고 설왕설래하기도 했다.
지난달 25일 새 정부 출범 이후 지난 6일까지 관보에 실린 법안과 조약이 단 1건도 없다고 한다. 지난해 하루 평균 법률 2건, 대통령령 3건이 실렸던 데 비하면 너무 초라하다. 정부조직법개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나타난 부작용으로, 정치권은 눈꼴사나운 정쟁을 그만 접고 마비된 국정을 빨리 살려야 하겠다.
정기홍 논설위원 hong@seoul.co.kr
관보(官報)는 말 그대로 정부에서 발행하는 기관지이다. 법령 개정과 부처 의결사항, 인사, 공고가 여기에 실린다. 내용이 난해하지만 그 시대의 정치와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첫 관보로는 조선 태조(1392년) 때 예문춘추관에서 발행한 ‘조보’(朝報)를 친다. 이후 1894년(고종 31년) ‘대한제국관보’란 제호로 발행되다가 정부수립 해인 1948년부터 ‘대한민국관보’라는 이름으로 맥을 잇고 있다. 관보는 왕조시대 길거리에 써 붙였던 방(榜)과도 궤를 같이한다. 세종실록에는 ‘대소 인원들이 그해(1429년)의 수교(受敎)한 것을 알지 못하여 범법한 자가 자못 많으니 금령조목(禁令條目)을 줄여 줄 친 게시판을 만들어 광화문 밖 등의 장소에 걸어 알려주게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이처럼 60여년을 이어온 근대식 ‘종이 관보’가 좀체 보기 힘들어졌다. 지난 2000년 10월 전자관보시대를 열면서 병행해 발행되다가 지금은 딱 11부만 인쇄된다. 국가기록원 3부 외에 국회도서관, 법제처, 헌법재판소 등 8군데에 1부씩만 들어간다. 청와대에서도 종이 관보를 못 보는 정도이니 귀하디귀한 몸이다.
관보에 관한 뒷얘기는 더러 전해진다. 정부는 일반인이 알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민감한 사안은 관보에만 슬쩍 넣고 숨기려는 꼼수를 쓰기도 했다. 부지런하고 눈치 빠른 기자들은 기자실에 비치된 관보에서 특종을 낚아채기도 했다. 숨기려는 의도만큼 사회적인 파장은 컸다. 관보는 요즘에도 논란의 중심에 선다. 최근 청와대에서 비서관급 인사를 관보에만 싣겠다고 하자 ‘관보 인사’란 비아냥을 듣고 있다. 최근 암으로 사망한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대통령이 병석에서 서명한 관보가 공개되자 그의 건강 상태를 놓고 설왕설래하기도 했다.
지난달 25일 새 정부 출범 이후 지난 6일까지 관보에 실린 법안과 조약이 단 1건도 없다고 한다. 지난해 하루 평균 법률 2건, 대통령령 3건이 실렸던 데 비하면 너무 초라하다. 정부조직법개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나타난 부작용으로, 정치권은 눈꼴사나운 정쟁을 그만 접고 마비된 국정을 빨리 살려야 하겠다.
정기홍 논설위원 hong@seoul.co.kr
2013-03-11 31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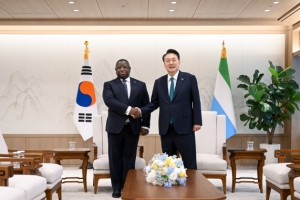












![전쟁·기후변화… 공멸해 가는 인류 깨우다[OTT 언박싱]](https://img.seoul.co.kr/img/upload//2024/02/16/SSC_20240216012138_N.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