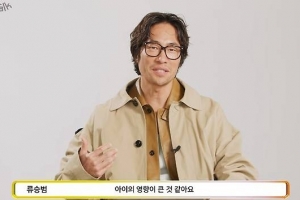김응식 농협창녕교육원 교수
이른 봄에 볍씨를 골라 못자리를 내고 또 본 논에 옮겨 심는 모내기를 해야 하며, 오뉴월 뙤약볕 아래서 비지땀을 흘리며 몇 차례나 김매기를 해야 하니, 쌀이 밥상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큰 수고로움이 있었는지 짐작하고도 남을 것이다.
지금 농촌 들녘은 가을걷이가 마무리되어 집집마다 김장을 담그는 등 월동준비가 한창이다.
농림수산식품부 발표에 따르면 2012년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이 45.3%로 사상 최저로 떨어졌다. 우리 국민이 필요로 하는 식량의 절반 이상을 외국산에 의존하고 있는 셈이다. 1990년만 해도 70%를 웃돌던 식량 자급률이 불과 20여년 만에 45%선까지 내려앉은 것이다. 더욱이 주식인 쌀 자급률은 2010년 104.5%에서 86.3%로 떨어져 최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식량 안보의 큰 위기가 아닐 수 없다. 이미 우리나라의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요소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먼저 벼 재배면적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1990년대 초반 120만ha를 웃돌던 벼 재배면적은 농지개발 수요 증가에 따른 전용 등으로 지난해 84만 9172ha로 줄었고 올해에는 83만 2625ha로 또다시 감소했다. 통계작성 이래 최저 수준이다.
또 다른 위협 요인은 쌀 농가의 소득 감소다. 2012년 국내 쌀 생산농가는 72만 4000가구로 조사됐다. 이들 쌀 농가가 1년 동안 힘들여 농사를 지어 벌어들인 소득은 10a당 60만원 수준이다. 가구당 700만원에 불과하다. 해마다 비료 등 생산비는 오르는 데 반해 쌀값은 제자리걸음이고 소득은 뒷걸음질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농사일을 접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내몰리는 것이다.
가뜩이나 지금 농촌은 농가 인구 및 농가 호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농가 인구의 고령화도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농부들이 쌀농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또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농지전용을 최소화하는 등 적정 우량농지를 확보하고, 또한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쌀·밭 직불제의 확대가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2004년 도하 개발 어젠다(DDA) 협상에 따라 2014년까지 쌀 관세화 유예기간 완료를 앞두고 있다. 범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향후 쌀 관세화 또는 관세화 유예에 대한 보다 면밀한 연구가 지금부터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며 세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을 개최할 정도로 외견상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다. 그러나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식량안보를 굳건하게 다져야 한다.
“후진국이 공업화를 통해 중진국으로 도약할 수는 있지만 농업과 농촌의 발전 없이는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없다”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미국의 사이먼 쿠즈네츠의 말을 다시 한 번 새겨 볼 때이다.
2013-11-27 3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