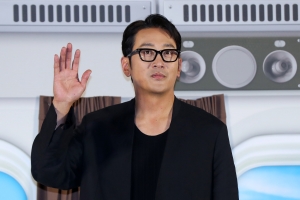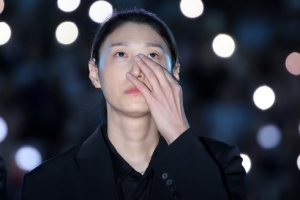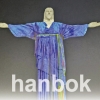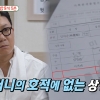‘잊힐 권리’를 법제화하는 작업이 본격화됐다. 잊힐 권리란 네이버 등 온라인상의 개인정보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어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위는 잊힐 권리를 담은 정보통신망법과 저작권법 개정안 논의에 들어갔다. 잊힐 권리를 맨 먼저 입법화한 곳은 유럽연합(EU)이다. 이혼·전과 등 반추하고 싶지 않은 기억이 ‘디지털 주홍글씨’로 남아 새로운 삶의 시작을 방해하는 것 등은 문제라며 지난해 관련 법안을 확정했다. 내년 발효가 목표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더 중시하는 미국은 반대 분위기가 강하다. 잊힐 권리가 도입되면 페이스북, 구글 등 주로 미국 기업이 직격탄을 맞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지만 찬반 논란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를 의식해서인지 국내에서 추진 중인 법제화 작업은 정보 삭제권 발동 주체를 당사자로 국한했다. 자신이 작성한 글이나 동영상 등만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EU에서와 마찬가지로 언론 보도 등은 삭제 대상이 안 된다. 다른 사람이 올린 글이나 사진 등은 표현의 자유와 상충되기 때문에 일단 ‘자신의 저작물’로 국한했다는 게 개정법안을 발의한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 측의 설명이다. 현행법상 자신의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에 관한 것이 아니면 삭제 권한은 인터넷 사업자에게 있다. 법제화에 반발하는 인터넷 업체들은 지금도 당사자의 요청이 있으면 삭제해 준다고 해명하지만 실제 시정 건수는 많지 않다.
철없던 시절에 생각 없이 쓴 글 때문에 채용시험에서 탈락하고 옛 애인과 찍은 사진이 계속 인터넷에 떠돌아다녀 결혼생활이 파탄 나는 일이 현실에서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다. 무차별 ‘신상털기’에 악용되기도 한다. 따라서 잊힐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이를 법제화하기까지는 신중한 논의가 요구된다. 공인인 경우 잊힐 권리 못지않게 ‘기억할 권리’와 ‘알 권리’가 중요하다는 반론과, 법적인 권리 대상이 되느냐를 둘러싼 법리 논쟁이 뜨겁기 때문이다. 복사·링크 등을 통해 무한정 복제되는 인터넷 공간의 속성상 기술적으로 잊히는 건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있다. 정치인이 선거철에 민심을 현혹하는 글과 공약을 쏟아냈다가 선거 뒤에 슬그머니 삭제를 요구하는 등의 악용 소지도 차단해야 한다. 국회는 충분한 여론 수렴과 전문가 공청회 등 사회적 공감대를 얻는 노력을 먼저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를 의식해서인지 국내에서 추진 중인 법제화 작업은 정보 삭제권 발동 주체를 당사자로 국한했다. 자신이 작성한 글이나 동영상 등만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EU에서와 마찬가지로 언론 보도 등은 삭제 대상이 안 된다. 다른 사람이 올린 글이나 사진 등은 표현의 자유와 상충되기 때문에 일단 ‘자신의 저작물’로 국한했다는 게 개정법안을 발의한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 측의 설명이다. 현행법상 자신의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에 관한 것이 아니면 삭제 권한은 인터넷 사업자에게 있다. 법제화에 반발하는 인터넷 업체들은 지금도 당사자의 요청이 있으면 삭제해 준다고 해명하지만 실제 시정 건수는 많지 않다.
철없던 시절에 생각 없이 쓴 글 때문에 채용시험에서 탈락하고 옛 애인과 찍은 사진이 계속 인터넷에 떠돌아다녀 결혼생활이 파탄 나는 일이 현실에서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다. 무차별 ‘신상털기’에 악용되기도 한다. 따라서 잊힐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이를 법제화하기까지는 신중한 논의가 요구된다. 공인인 경우 잊힐 권리 못지않게 ‘기억할 권리’와 ‘알 권리’가 중요하다는 반론과, 법적인 권리 대상이 되느냐를 둘러싼 법리 논쟁이 뜨겁기 때문이다. 복사·링크 등을 통해 무한정 복제되는 인터넷 공간의 속성상 기술적으로 잊히는 건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있다. 정치인이 선거철에 민심을 현혹하는 글과 공약을 쏟아냈다가 선거 뒤에 슬그머니 삭제를 요구하는 등의 악용 소지도 차단해야 한다. 국회는 충분한 여론 수렴과 전문가 공청회 등 사회적 공감대를 얻는 노력을 먼저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13-06-18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