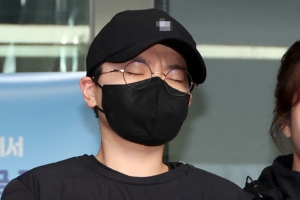의사가 멀리 떨어져 있는 환자를 진단하고 처방을 해주는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엊그제 정부가 입법 예고했다. 원격진료는 혈압이나 뇌파, 심전도 같은 환자의 기록을 주고받으면서 진료를 하기 때문에 정보통신(IT) 기술이 발달한 우리나라에 유리한 제도다. 그러나 오진(誤診) 가능성 등 부작용이 없지 않고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우려하는 의료계의 반발도 만만찮다. 이런 난관을 극복하면서 우리 실정에 맞게 단계적으로 정착시켜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
원격진료는 특히 병원이 가까이 없는 도서·벽지 주민들에게는 희소식이다. 2009년부터 원격진료를 시범 실시하고 있는 경북 영양군의 진료 건수는 첫해 1770건에서 지난해 4853건으로 2.7배나 증가했다. ‘계속 이용하겠다’는 주민이 84%를 넘을 만큼 만족도도 높다. 정부는 오지 주민뿐만 아니라 노인·장애인·군인·재소자와 병원에 가기 어려운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 등에게도 원격진료를 허용하겠다고 하니 기대가 크다.
원격진료는 의료계의 표현대로 진료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다. 본래 의미의 진료란 의사가 환자를 대면하면서 묻고, 보고, 청진을 하고, 만지거나 두드려보는 방식이다. 그러나 화상진료로 묻거나 볼 수는 있어도 다른 진찰은 할 수가 없다. 그 때문에 오진 우려가 크고 의료사고가 발생할 때 책임을 누가 지느냐는 문제가 발생한다. 여기에다 원격진료는 지리적 한계가 없기 때문에 결국 좋은 인력과 장비를 갖춘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을 막을 수 없다는 점 등을 내세우는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다. 이런 이유로 원격진료는 수십 년 동안 시범운영에 머물렀고 2010년에도 비슷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가 폐기된 바 있다.
정부안은 이런 반발을 염두에 둔 듯하다. 재진(再診) 환자만 허용하고 동네 의원부터 시작하겠다고 한다. 골목 병원이 죽는다는 걱정도 덜어질 것으로 보인다. 원격진료는 의료산업 육성의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정보통신기술과 의료를 결합한 ‘U헬스’시장 규모는 내년에 2540억 달러로 급성장할 전망이다. 선진국들은 이미 10여년 전부터 원격진료 확대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오지 환자들을 위해 이점이 많고 성장 전망이 밝다면 의료계도 무조건 반대만 해선 안 된다. 의료 수혜자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국가·환자·병원이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게 옳다고 본다.
원격진료는 특히 병원이 가까이 없는 도서·벽지 주민들에게는 희소식이다. 2009년부터 원격진료를 시범 실시하고 있는 경북 영양군의 진료 건수는 첫해 1770건에서 지난해 4853건으로 2.7배나 증가했다. ‘계속 이용하겠다’는 주민이 84%를 넘을 만큼 만족도도 높다. 정부는 오지 주민뿐만 아니라 노인·장애인·군인·재소자와 병원에 가기 어려운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 등에게도 원격진료를 허용하겠다고 하니 기대가 크다.
원격진료는 의료계의 표현대로 진료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다. 본래 의미의 진료란 의사가 환자를 대면하면서 묻고, 보고, 청진을 하고, 만지거나 두드려보는 방식이다. 그러나 화상진료로 묻거나 볼 수는 있어도 다른 진찰은 할 수가 없다. 그 때문에 오진 우려가 크고 의료사고가 발생할 때 책임을 누가 지느냐는 문제가 발생한다. 여기에다 원격진료는 지리적 한계가 없기 때문에 결국 좋은 인력과 장비를 갖춘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을 막을 수 없다는 점 등을 내세우는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다. 이런 이유로 원격진료는 수십 년 동안 시범운영에 머물렀고 2010년에도 비슷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가 폐기된 바 있다.
정부안은 이런 반발을 염두에 둔 듯하다. 재진(再診) 환자만 허용하고 동네 의원부터 시작하겠다고 한다. 골목 병원이 죽는다는 걱정도 덜어질 것으로 보인다. 원격진료는 의료산업 육성의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정보통신기술과 의료를 결합한 ‘U헬스’시장 규모는 내년에 2540억 달러로 급성장할 전망이다. 선진국들은 이미 10여년 전부터 원격진료 확대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오지 환자들을 위해 이점이 많고 성장 전망이 밝다면 의료계도 무조건 반대만 해선 안 된다. 의료 수혜자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국가·환자·병원이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게 옳다고 본다.
2013-10-31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