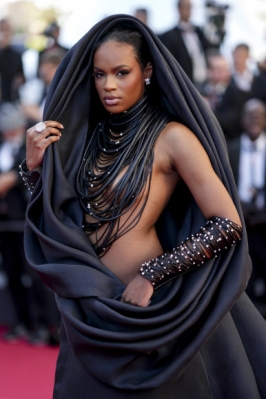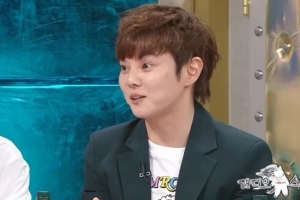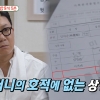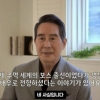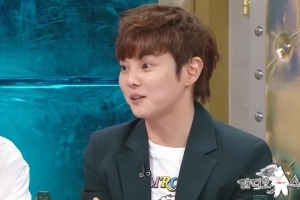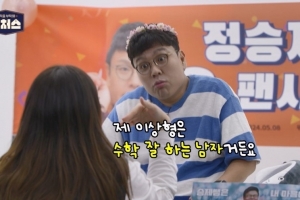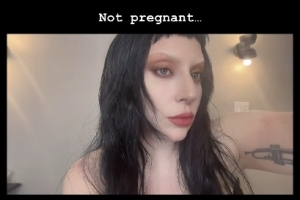2006년, 지금은 사라진 서울 명동의 한 극장에서 ‘디어 평양’이라는 영화를 봤다. 재일교포 2세 감독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간부인 아버지와, 북한으로 보낸 아들 가족의 뒷바라지를 열심히 한 어머니에게 카메라를 비추고 있었다. 세 오빠를 북한에 바친 부모에 대한 원망으로 반항의 시기를 보낸 감독은 10년 넘게 카메라를 들면서 부모의 마음에 점점 다가가게 된다. 이어 ‘굿바이, 평양’(2009)에서는 북한으로 떠난 오빠들과 가족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두 편의 작품 활동 결과 그녀는 북한으로부터 입국 금지를 당하고 만다. 다큐멘터리 감독으로서 가족과 국가의 주제에 매달려 온 그녀가 극영화를 찍었다. 얼핏 두 편 다큐멘터리의 드라마 버전으로 보이는 ‘가족의 나라’는 2012년 최고의 일본 영화로 평가받기에 이른다.
1997년 봄, 리애의 오빠 성호가 북한에서 돌아온다. 조총련계 북송 사업이 한창이던 25년 전, 성호는 16살의 나이에 ‘귀국자’ 신분으로 북한으로 떠났다. 그곳에서 가족을 꾸리고 살던 그가 종양 치료를 위해 3개월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하게 된 것이다. 북에서 온 감시자 탓에 성호는 일본에서도 자유롭게 활동하지 못한다. 일본 의료진은 3개월만으로는 치료할 수 없다는 진단을 내리고 리애의 가족은 성호의 체류 기간을 연장할 방안을 강구한다. 하지만 북에서 갑작스러운 귀국 명령이 떨어지자 성호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다. 리애와 가족 또한 그들을 옭아매는 북한의 시스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오빠의 조국이 너무 밉다는 리애에게 성호는 “너의 인생을 자유롭게 살아”라고 말한다.
수십 년 만에 고향에 온 성호는 동네 어귀에 내려 천천히 걷는다. 시장을 지나 정든 골목을 찬찬히 돌아볼 즈음, 멀리 집 앞에서 어머니가 그를 맞이한다. 미세하게 흔들리던 카메라가 움직임을 멈추면 어머니와 아들은 눈물의 재회를 나눈다. 영화는 끝에서도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몇 가지 물건을 통해 혼란스러운 이별의 슬픔을 전한다. 하지만 ‘가족의 나라’는 가족의 이별을 무기로 눈물을 강요하는 작품은 아니다. ‘가족의 나라’의 몇몇 장면은 비좁은 공간을 차지한 인물들을 빼어난 구도로 포착한다. 감독 양영희의 본마음은 그 구도 속에 숨어 있다. 그녀는 하나의 민족이 이념 아래 싸우는 대신 좁은 땅에서 아름답게 자리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양영희의 출생지는 일본이지만 그녀의 아버지는 북한을 조국으로 선택했고 그녀의 국적은 한국이다. 그녀는 국가나 조국이라 불리는 것의 본질적인 측면을 건드린다. 대개 사람에게 국가는 선택의 대상이 아님에도 국가는 그 속에 사는 인간에게 폭력적인 성향을 종종 드러낸다.영화가 가족에게 끼칠 영향을 걱정하며 다큐멘터리 작업을 진행해 온 양영희는 어느덧 창작자의 자유로운 위치에 오른 것 같다. 얼마 전 인터뷰에서 그는 놀랍게도 자기 가족을 ‘재미있는’ 대상으로 여기게 됐다고 고백했다. 기나긴 고통의 시간을 지나 가족을 오롯이 이야기의 소재로 삼는 경지에 올랐다는 말이다. 개인사의 이용이나 낭만적인 회고는 ‘가족의 나라’에 없다. 엄격하면서도 담백한 이야기야말로 ‘가족의 나라’의 핵심이다. 7일 개봉.
영화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