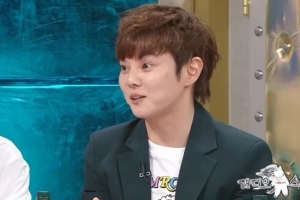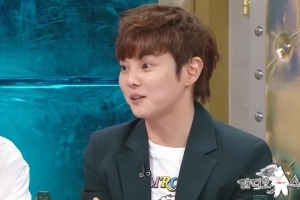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폴란드의 리버포. 하수구 검시관인 소하는 아내와 어린 딸의 생계를 위해 빈집 털이도 마다하지 않는다. 어느 날 온갖 악취와 암흑뿐인 하수구에 독일군의 손아귀에서 탈출한 유대인들을 발견한다. 유대인들은 소하에게 비밀을 지켜 달라며 돈을 건넨다. 신고한다면 더 큰 돈을 손에 쥘 수 있지만, 그들의 부탁을 들어준다. 누구보다 하수구의 지리에 밝은 그는 11명의 유대인에게 거처를 마련해 주고 음식도 갖다 준다. 하지만 하수구를 타고 볶은 양파 냄새가 올라온다는 신고가 독일군에게 접수되면서 상황은 복잡해진다. 독일군이 수색에 나선 것이다. 소하는 자신은 물론 가족의 목숨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는 상황에 갈등하게 된다.
2차대전 당시 나치 독일 치하에서 420일간 하수구에서 생존한 11명의 유대인, 죽음을 무릅쓰고 이들을 지킨 한 폴란드인 남자의 이야기를 다룬 ‘어둠 속의 빛’(11일 개봉)은 실화다. 스티븐 스필버그의 ‘쉰들러의 리스트’(1993), 로베르토 베니니의 ‘인생은 아름다워’(1997), 로만 폴란스키의 ‘피아니스트’(2003), 에드워드 즈윅의 ‘디파이언스’(2009) 등 이른바 홀로코스트 영화다. 실제 하수구에서 살아남은 소녀 크리스티나 히게가 쓴 ‘녹색스웨터를 입은 소녀’란 회고록을 영국 유명 작가 로버트 마셜이 ‘리버포의 하수구에서’란 소설로 옮겼고, 폴란드 감독 아그네츠카 홀란드가 다시 영화로 만들었다.
‘토탈이클립스’ ‘카핑 베토벤’ 등으로 한국 관객과도 친숙한 홀란드 감독에게 ‘어둠 속의 빛’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그의 조부모는 유대인을 강제로 격리한 게토에서 숨졌다. 그의 어머니는 1944년 바르샤바 봉기에 참여했던 레지스탕스 그룹의 일원이었다. 자칫 감정적으로 흥분할 법하지만, 홀란드는 냉정을 잃지 않는다. 결코 소하를 의인화하거나 영웅처럼 묘사하지 않는다. 처음 유대인 도망자들을 만났을 때만 해도 소하는 한몫 잡고 나중에라도 신고할 생각이었다. 사명감 따윈 없었다. 선과 악이 공존한다기보다는 평범한 우리 중 한 명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달라진다. 서로 의지하며 빛도 들어오지 않는 하수구에서 견뎌 내는 유대인의 모습을 보며 어느 순간 진심으로 그들을 걱정하게 된다. 소하가 구해 준 유대인들도 선한 존재만은 아니었다. 가족을 내팽개친 비열한 가장도 있고, 두려움에 휩싸여 갓 태어난 아기를 질식사시킨 엄마도 있다.
대부분 관객이 비슷한 경험조차 못해 본 일임에도 ‘어둠 속의 빛’에 공감할 수 있는 건 외려 등장인물의 불완전함 때문이다.
공포 앞에 한없이 작아지고, 이기적인 건 누구나 마찬가지다. 나(관객)보다 더 나약한 인간처럼 보였던 극중 인물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진정한 용기와 희망을 보여 줄 때 감동은 더욱 커진다. 지난해 아카데미시상식에서 외국어영화상 후보에 올랐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