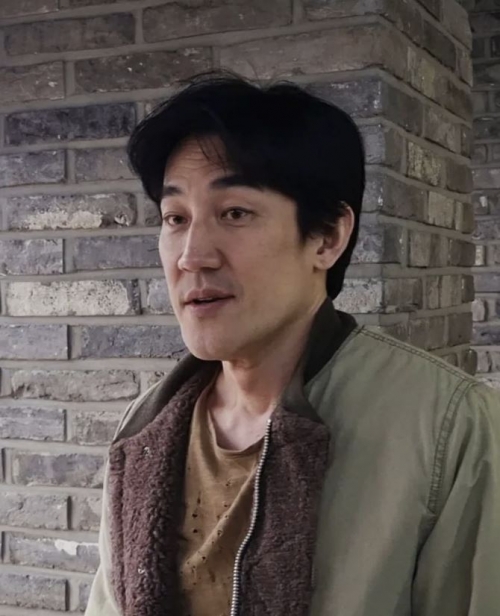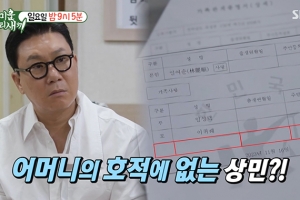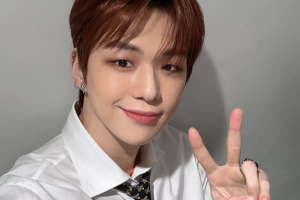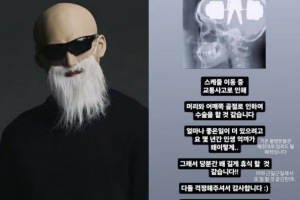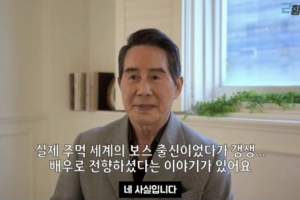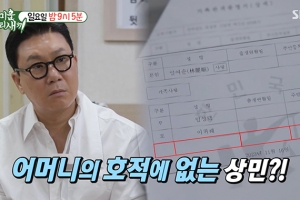/
7







지난 21일 종영된 KBS 드라마 ‘직장의 신’에서 ‘미스 김’으로 열연한 배우 김혜수(43)는 드라마가 끝난 뒤에도 더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27일 서울 강남의 한 카페에서 만난 그는 “드라마가 끝나고 나서 ‘직장의 신’ 스태프들과 1박 2일 MT, 영화 ‘관상’ 포스터 촬영 등이 이어져 한숨 돌릴 틈도 없었다”고 웃었다. 그런데도 신기한 건 피곤한 기색이라곤 찾아볼 수가 없다는 대목이었다. 역시 그는 드라마 밖에서도 여전히 ‘철두철미한’ 미스 김이었다.
‘직장의 신’은 김혜수의 독특한 말투(“그건 제 업무가 아닙니다만”)와 기상천외한 에피소드(탬버린 연주, 홈쇼핑 내복모델, 메주쇼 등)들로 방영 내내 연일 포털사이트들을 달궜다. 그를 일컬어 ‘코믹연기에 신들렸다’는 찬사도 있었다. 그러나 정작 스스로는 코미디를 염두에 두고 연기한 게 아니란다. “말투와 행동 하나하나가 어떻게 하면 미스 김다울까, 그것만 생각했어요. 자발적으로 계약직 인생을 사는 미스 김은 우리가 익히 봐왔던 모습이 아니죠. 그런데 그게 재밌어 보였나 봐요.”
실제로 시청자들을 배꼽잡게 만든 장면들도 “미스 김다운 모습”을 최대한 살리려는 과정에서 탄생했다. “탬버린을 치고 청소를 하고 타자를 치는 일은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지만 미스 김은 뛰어난 집중력을 발휘해 현란한 손짓으로 일을 완성하기 때문에 ‘저 정도면 수당을 줘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게 했던 거죠.” 회식 자리에서 현란한 탬버린 연주로 수당을 받아내는 장면을 위해 그는 한국과 일본의 ‘탬버린 달인’을 참조하고 탬버린을 발목에 두드리며 연습하다 피멍이 들기도 했다. 홈쇼핑 내복모델 장면에서는 미스 김이 어떻게든 시선을 끌어 내복을 완판해야 했으므로 “독보적인 워킹과 유연성”을 보여야 했다. 그런데 생각보다 무대가 좁아서 고민하다가 나온 동작이 바로 ‘내복쇼’였다.
‘직장의 신’은 엄밀히 시청률로만 따졌을 때 크게 성공한 작품은 아니었다. 방영 당시 방송 3사 월화드라마 중 시청률은 2위에 머물렀다. 그러나 드라마가 그려낸 직장에서의 갑을관계, 계약직의 서러움, 사내 정치 등의 코드에 시청자들이 즉각즉각 반응하면서 연일 화제가 됐다. 때마침 ‘라면상무’ 사건, 남양유업의 ‘밀어내기’ 사건 등 잇따라 터진 사회적 이슈 사건들도 드라마가 주목받는 데 한몫했다. 시청자들이 계약직이면서 ‘슈퍼갑’인 미스 김에 환호하는 한편으로 현실의 맨얼굴을 돌아보게 된 것. “좀처럼 다루기 힘든 강력하고 굵직한 메시지를 가벼운 방식으로 터치한 드라마였어요. 그러나 핵심을 비켜가지는 않았죠. 그런 드라마의 매력에 제가 이끌렸던 거였죠.”
당분간 ‘미스 김’은 배우 김혜수의 또다른 이름이 될 듯하다. 강렬한 캐릭터가 차기작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까.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는 그다. “굳이 미스 김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생각이 없어요. 제 연기 인생에 있어 지금 이 순간이 전부는 아니거든요. 앞으로 어떤 연기를 하든 최선을 다해 치열하게 임하면 그뿐이니까요.”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