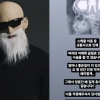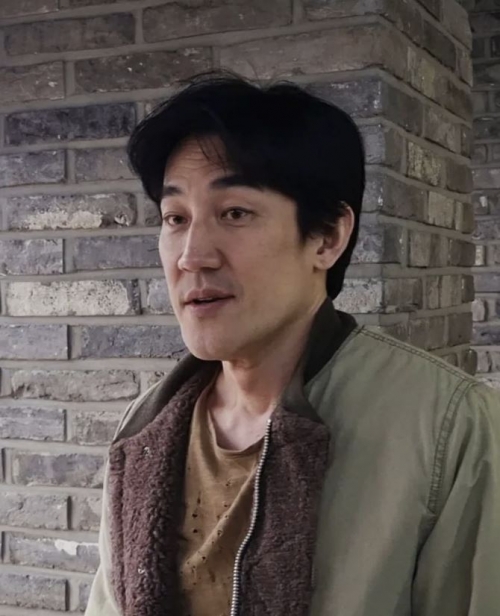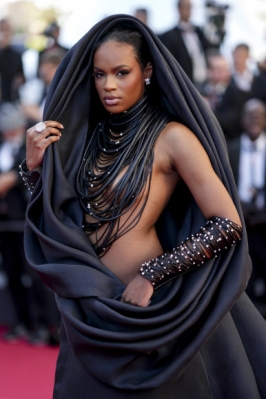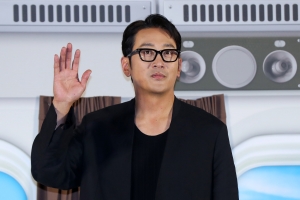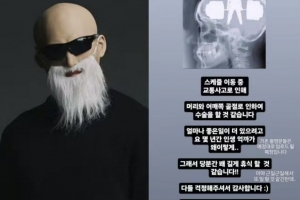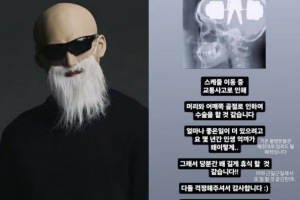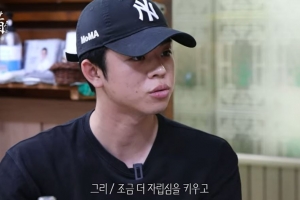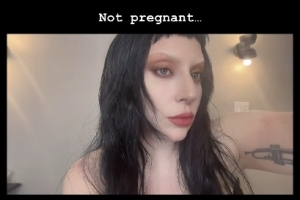카사노바의 위대함은 유럽 전역을 무대로 펼친 화려한 섹스 행각에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일대기를 글로 써 남겼다는 데 있다. 실제로 그는 수많은 섹스 행각 뒤로 추잡하고 창피스러운 일을 겪어야만 했다. ‘셰임’은 그 추잡함, 그 창피함에 관한 영화다. 그런데 브랜든이 겪는 수치는 관객에게 낯선 대상이다. 섹스중독에 걸린 사람들 사이에서도 비정상의 정의는 개인이 판단할 문제로 남겨둔다고 하는데, ‘셰임’을 보는 평범한 관객은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기도 힘들다. 브랜든은 섹스에 굶주린 정도를 넘어선 인물이다. 굶주림은 면할 수 있으나, 그의 욕망을 채우기란 불가능해 보인다. 그렇다면 그는 치유되지 못할 정신병자인가.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셰임’과 관객의 몫이 아니다.
미술 작가로 활동한 스티브 매퀸이 만든 두 편의 영화 ‘헝거’와 ‘셰임’은 공히 육체에 관한 영화다. ‘헝거’는 아일랜드 저항 운동가의 기록이기에 앞서 생존의 사명을 포기한 남자의 이야기다. 두 영화에서 육체는 머리와의 전투가 벌어지는 공간이다. ‘헝거’에서 배고픈 몸은 기필코 저항을 고집하는 정신과 싸운다. 그의 몸은 육체의 소멸을 무릅쓰는 정신에 맞선다. 곪아터진 상처는 정신에 저항하는 육체의 신호다. ‘셰임’에서도 몸과 머리는 갈등을 빚는다. 몸은 수모를 겪고 있는데, 영혼은 불타는 욕망을 부채질한다. 아마 처음에는 브랜든도 몸과 머리의 투쟁을 어떻게든 소화시키려고 노력했을 것이다. 웃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하는 지금, 브랜든은 싸움을 그만둔 상태의 인물이다. 그래서 그는 슬픈 존재다.
매퀸의 영화는 청록색이다. ‘헝거’는 영혼과 육체의 소멸을 청록색으로 그렸으며, ‘셰임’도 청록색으로 시작한다. 좌우로 와이드스크린 전체를 차지한, 침대에 누운 남자의 몸을 청록색이 감싸고 있다. 시린 녹색 톤의 몸은 아름답지만, 청록색은 몸의 색깔과 거리가 멀다. 매퀸은 머리와 몸의 전쟁 때문에 멍든 피부만이 그런 색깔을 띤다고 단호하게 말한다. 동생이 찾아와 곁에 있을 때에야 영화는 서서히 노란색 톤을 흡수한다. 그럼에도 브랜든은 인간적인 관계를 잇지 못한다. 지옥 같은 밤 내내 허우적거린 그가 문득 새벽을 맞이하는 순간, ‘셰임’은 마침내 육체의 색깔-피의 붉은 색을 내뿜는다. 늦은 걸까. 감정을 되찾은 그는 절규한다. 다시 물어본다. 늦은 것일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사는 데 너무 늦은 것은 없다.
영화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