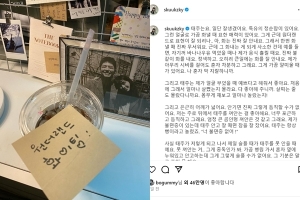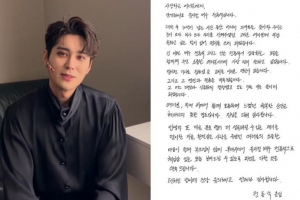그동안 감독으로서의 자의식은 더욱 확고해졌다. “화려한 상업영화보다는 저예산 독립영화 감독에 더 가까워진 것 같다”는 그다. 감독과 배우의 차이에 대해 그는 “감독은 모니터를 보는 사람이고 배우는 연기를 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빠듯한 예산과 촉박한 촬영 일정 속에서 감독은 연출에, 배우는 연기에만 집중해도 모자란다는 뜻이다. “배우가 ‘필’이 안 오니까 다음 날 찍자고 할 때가 있다. 나도 연기할 때는 그런 경험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현장에서는 그럴 수 없었다. 돈이 없는데 ‘필’을 어떻게 찾겠나, 빨리 찍어야지.” 흥행 성적에 따라 스태프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한 것도 그 자신이 배우이기 이전에 한 명의 영화 스태프로서 영화 제작의 열악한 현실을 일찍부터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마이 라띠마’는 대학 시절부터 15년 넘게 구상했던 영화다. 코리안 드림을 안고 한국인과 국제결혼을 한 태국 여성 마이 라띠마(박지수)와 직장도 없이 빚에 허덕이는 청년 실업자 수영(배수빈)의 엇갈린 사랑 이야기를 그렸다. “오래전부터 이주 여성이 한국 사회의 중요한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용기가 없어 좀 더 빨리 제작하지 못했다”는 그는 “아벨 페라라 감독의 ‘배드 캅’처럼 덜 성장한 어른이 자신의 도덕성과 인간성을 회복해 가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본성에 가까운 감독이 되고 싶다”는 그가 감독으로서 강조하는 것은 이야기의 비정형성이다. “통속적이지 않으면서 엉뚱한, 나만의 색깔이 담긴 드라마를 찍고 싶다”고 덧붙인다. 우연히 마주친 마이 라띠마와 수영이 즉흥적으로 사랑에 빠지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조금은 억지스럽고 작위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런 갑작스러운 형태가 지금의 젊은이들에 훨씬 가깝지 않나. 전형적이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호기도 있었다.”
유 감독은 감독으로서의 삶도, 배우로서의 삶도 모두가 만만치 않다는 사실을 이제 알 것 같다고 말한다. 영화를 찍기 위해 부인과 이혼한 이란의 아미르 나데리 감독이나 ‘머시니스트’의 배역을 위해 20㎏ 이상 체중을 뺀 크리스천 베일 같은 연기자들을 예로 든다.
하지만 그는 “영화에 미치기”보다는 영화와 삶이 항상 건강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믿는다. 다만 자기 확신을 할 수 있을 때까지 노력할 뿐이다. “확신을 갖는 만큼 만족도 하느냐고? 그보다는 미련을 갖지 않는다는 쪽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 미련이 남지 않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하니까.”
배경헌 기자 baen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