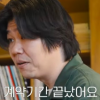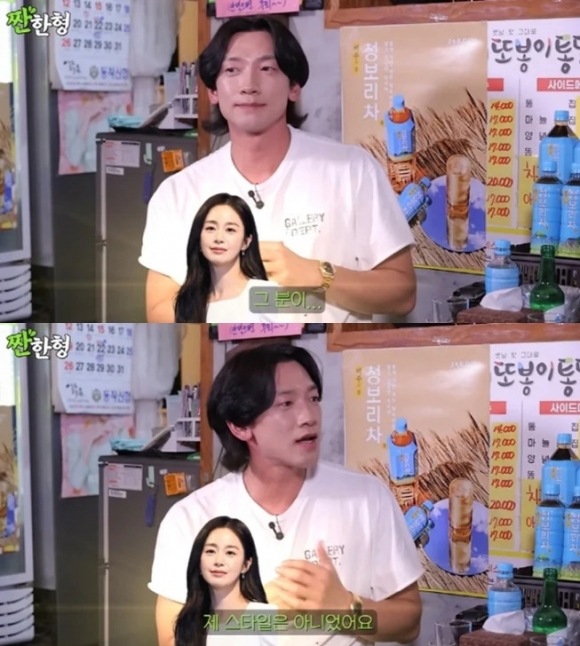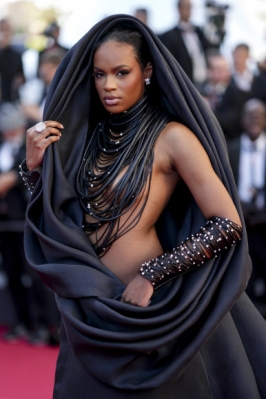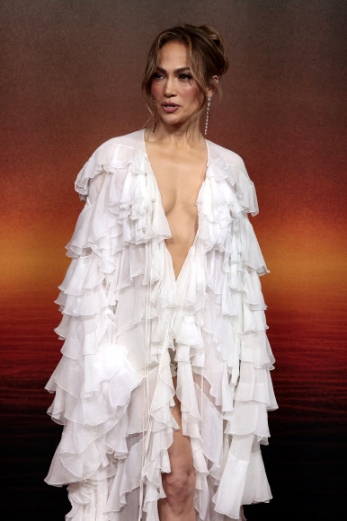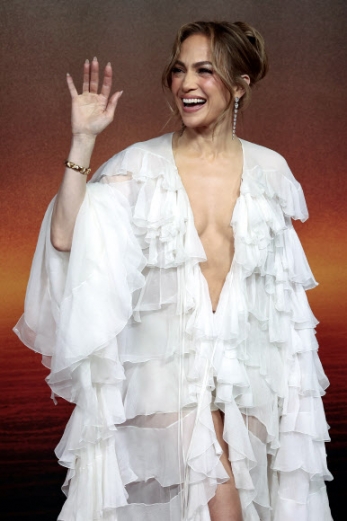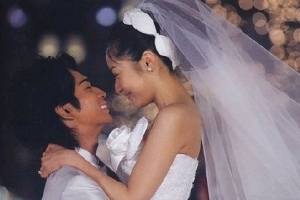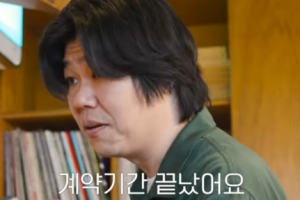‘명왕성’은 소름끼치는 영화다. 보는 사람의 감정을 흔들어 놓는다는 점에서 어지간한 스릴러 못지 않다. 인물을 지나치게 양극단으로 몰아 다소 껄끄럽지만, 그것으로 인한 효과까지 부정하기란 힘들다. 장르영화였다면 막대한 긴장감에 큰 점수를 주었을 테지만, 영화의 스릴을 즐겼다간 곧 죄의식을 느껴야 할 판이다. ‘명왕성’은 장르영화가 아니라 절실한 각성을 의도한 교훈극이기 때문이다.
‘명왕성’이 교육 상황을 급진적으로 비판하고 혁명적인 행동을 유발하는 영화였다면 차라리 명확하게 반응했을 것 같다. 예를 들어, 영국의 교육제도를 겨냥한 린제이 앤더슨의 ‘이프’(1968)를 본 사람은 무엇을 지지하고 부정할지 어느 정도는 판단 가능하다. 반면 태도를 강요하는 ‘명왕성’을 보면서 선뜻 손을 들어주기를 망설이는 건 왜일까. 영화가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하지만, 영화의 자세가 못내 아쉽다.
‘명왕성’은 토끼를 사냥하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연약한 동물은 이내 붙잡혀 죽음을 맞는다. 학업에 허덕이는 학생들이 토끼일 거라고 누구나 짐작할 텐데, 영화는 예상을 뒤엎는다. 질문은 거기에서 비롯된다. 악당은 언제 어디에나 있다. 하지만 모든 학생이 선두에 선 악당을 부러워하고 그들의 지위를 좇는 건 아니며, ‘명왕성’을 보기 전에 입시 경쟁의 현실과 사회적 폐단을 몰랐다고 말한다면 그건 거짓말이다. 진실에 대한 분노가 아닌 현실의 울화통을 폭발시킨 소년의 행동은 문제를 축소시킬 따름이다.
십대를 다룬 영화라고 해서 꼭 인간 정신의 위대함을 가르칠 필요는 없다. 다만 현실을 재연하고 비판하는 것 만큼 유의미한 일은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 서로 이야기하도록 돕는 일이다. ‘명왕성’은 후자가 더욱 절실하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닐스 말로스의 ‘지혜의 나무’(1981)를 다시 보았다. ‘지혜의 나무’는 일상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것들로 마음의 상처를 받는 아이들에 관해 함께 고민하도록 이끄는 작품이다. ‘명왕성’보다 ‘지혜의 나무’에 더 끌린다고 해서 현실을 모르는 순진한 사람이라고 폄하당하고 싶지는 않다. 적어도 자라는 나무에게는 물을 주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고 믿는다. 15세 관람가.
영화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