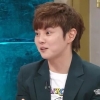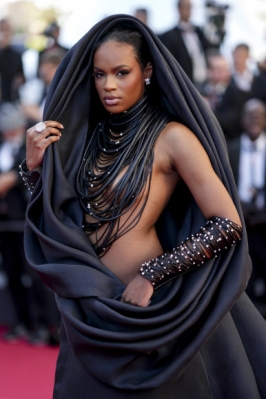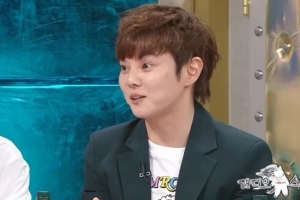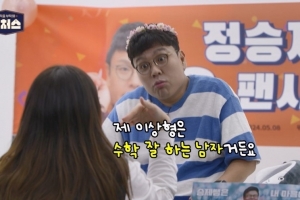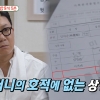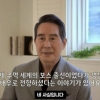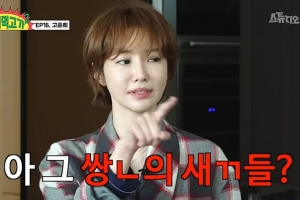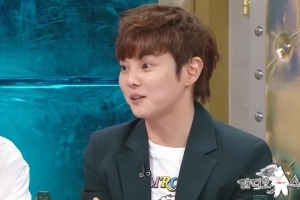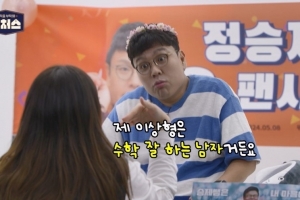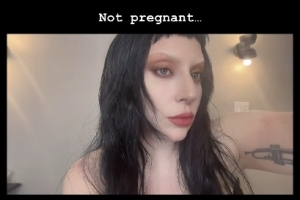그만큼 이 영화는 까미유를 소재로 한 다른 영화들보다 더 깊은 애정과 연민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고집스러우리만치 건조하고 담담하게 진행되는 내러티브 구조는 오히려 감독의 뜨거운 심중을 드러낸다. 20대를 다 바쳤던 연인과의 관계가 배신과 모함으로 얼룩져 버린 후, 조각가로서의 재능조차 마음껏 펼쳐보지 못하고 정신병원에서 삶을 마감해야 했던 한 여인의 지난(至難)한 세월을 흥미롭게 그려내는 것은 너무 잔인한 일이기 때문이다. 대신, 감독은 종종 까미유를 클로즈업하거나 시점 샷을 활용함으로써 정서적 공감대를 이끌어낸다. 광기로 오인된, 그러나 진정한 천재성이 깃든 까미유의 시선은 햇빛을 가리고 있는 커튼이나 하늘로 손을 뻗은 나뭇가지처럼 일상적인 사물에 자주 머물면서 의미를 부여하는데, 이런 샷들을 통해 관객들은 잠시나마 그녀의 사색(思索)을 공유하게 된다. 제대로 미치지 않고는 견디기 힘든 정신병원의 일상과 함께.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물론 프랑스가 낳은 우리 시대의 여배우, 쥘리에트 비노슈의 연기이다. 헝클어진 머리와 입가의 주름, 낡은 블라우스도 그녀만의 독보적인 분위기를 숨길 수는 없지만 그것은 곧 까미유의 매력으로 승화되었다. 정신과 의사에게 심경을 줄줄이 털어놓는 약 4분간의 롱 테이크가 보여주듯 쥘리에트 비노슈는 어떤 과장도 억지도 용납하지 않는 특유의 자연스러움과 섬세함으로 자신만의 까미유를 창조해냈다. 어떤 면에서 이 영화는 ‘쥘리에트 비노슈의 까미유 끌로델’이 됐어야 마땅한 작품이다. 그녀를 빼놓고 이 영화를 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지천명(知天命)의 나이, 수십년의 연기 경력 동안 제 역할을 다해왔지만 이 영화는 그녀를 대표하는 필모그래피로 오래 남을 것이다. 95분. 24일 개봉. 15세 관람가.
윤성은 영화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