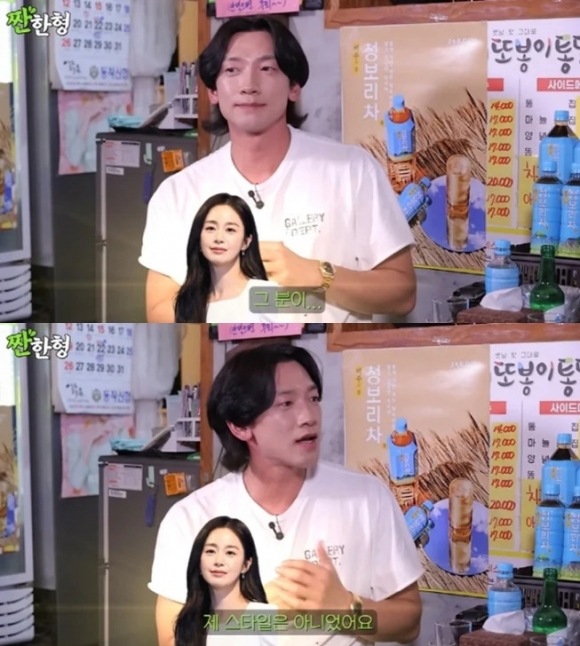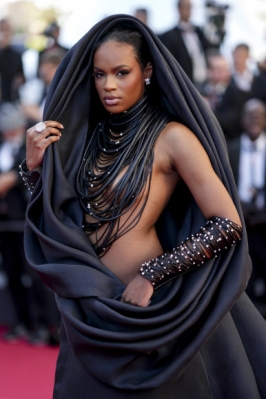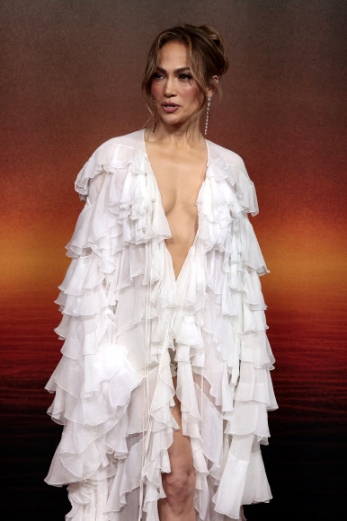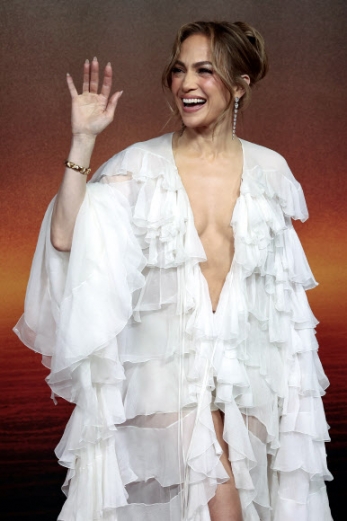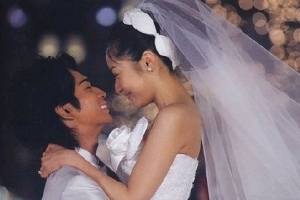선택에 논리를 세우는 것은 그 다음이다. 이런 경우의 선택은 ‘정의’보다는 ‘통념’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의 료타 부부는 병원의 실수로 아이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면서 “낳은 자식과 키운 자식 중 누구와 살 것인가?” 하는 문제에 맞닥뜨리게 된다. 통계가 입증하듯 부모들은 대부분 ‘낳은 자식’을 택하므로 통념상의 답은 정해져 있는 셈이고, 료타 부부 역시 그에 저항할 용기나 의도는 없어 보인다. 그러나 이미 6년이나 길러온 아들과 생면부지의 사람들이 키워왔던 아들을 맞바꾸는, 이 상식 밖의 교환은 고통을 담보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는 여러모로 1960년대 말 한국에서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던 ‘미워도 다시 한 번’(정소영)을 떠올리게 한다. ‘미워도 다시 한 번’은 미혼모인 어머니와 다른 가족이 있는 아버지 사이에서 누구를 선택하더라도 통렬한 이별을 겪어야 하는 어린 아들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다. 그러나 ‘미워도 다시 한 번’이 신파 특유의 과장된 화법을 앞세워 극을 한껏 고조시킴으로써 우리 어머니들의 손수건을 적셨던 것과 달리, 심각한 순간조차 가벼운 위트로 장식한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는 훨씬 담담하고 완만하게 진행된다. 그럼에도 종반으로 갈수록 관객들의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은 전혀 다른 유형의 최루성 때문인데, 이 영화는 두 부부의 현실적인 대화와 소소한 일화들을 차곡차곡 축적시키면서 그들의 비극적 상황에 머리로부터 동참하게 만드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작품의 진정한 탁월함은 아이가 뒤바뀐 가정이 겪는 아픔을 다룬 데서 멈추지 않고 대비되는 두 인물들, 즉 돈은 잘 벌지만 늘 바쁜 료타와 가난해도 항상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유다이를 통해 ‘아버지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으로 나아갔다는 데 있다. 료타가 류세이에게 자신을 아버지로 부를 것을 강요하고 류세이가 그 이유를 누차 반문하는 장면에서 볼 수 있는 첨예한 대립은 이 부자(父子) 사이에 전혀 다른 아버지의 개념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한 번도 져본 적 없이 살아왔던 료타는 길러준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류세이로부터 아이러니하게도 ‘진짜’ 아버지로 인정받아야 하는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해 있다. 그는 아들을 낳았을 때가 아니라, 그 아들을 기르면서 비로소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어머니가 아닌, ‘아버지 되기’에 초점을 맞춘 기획부터 일상의 세밀한 관찰력으로 완성된 에피소드들 그리고 료타 및 유다이 캐릭터에 부여한 생명력은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표 가족 영화의 숙성된 맛, 그 혀끝의 행복을 그대로 느끼게 한다. ‘아버지’라는 이름이 버겁고, ‘아버지 노릇’에 지쳐 있는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에게 일람을 권한다. 19일 개봉. 전체 관람가.
윤성은 영화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