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는 분노의 제왕…사도세자, 반역죄로 죽었다”
왕이 차기 왕으로 점찍은 아들을 죽인 사건. 조선시대 황금기로 손꼽히는 영정조 시대에 이런 참혹한 일이 있었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으로 보인다. 그렇기에 무엇을 이유로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느냐는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된다. 사도세자가 미쳤기 때문이라는 ‘광증(狂症)설’은 널리 알려진 것이고, 당시 주도세력인 노론의 반대편에 섰다가 죽었다는 ‘당쟁희생설’도 등장한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

●광증설·당쟁희생설 치우쳐선 안 돼
신작 ‘권력과 인간: 사도세자의 죽음과 조선 왕실’(문학동네 펴냄)을 내놓은 정병설 서울대 국문학과 교수는 “사도세자가 결국 죽음에 이른 것은 영조의 관점에서 본 반역죄가 결정적인 계기”였다고 주장한다.
가장 널리 알려진 ‘광증설’은 사도세자의 부인 혜경궁 홍씨(경의왕후)가 쓴 ‘한중록’을 기초로 한다. ‘당쟁희생설’은 혜경궁의 아버지 홍봉한을 포함한 노론파가 소론을 옹호한 사도세자를 모함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내용이다. 아들 정조 때 남양 홍씨 집안이 배척당하자 혜경궁이 이를 변명하기 위해 ‘한중록’을 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없다는 것이다.
“광증이 있었지만,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었습니다. ‘영조실록’에 보면 영조가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두던 날 사돈 홍봉한에게 ‘말하기 어려운 변(難言之變)’이 있어 세자가 병이 있어도 부득이 처분할 수밖에 없다고 하거든요.”
책에는 세자의 광증이 어느 정도였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 장번내관 김한채의 목을 친 뒤 이후 내관·내인, 심지어 생모 선희궁까지 죽이려 들었다고 전한다. 여기까지는 영조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그 칼 끝이 영조를 향하게 되면서 ‘결정’을 내리게 됐다는 설명이다.
“‘대천록’과 ‘현고기’, ‘모년기사’ 등에 선희궁이 영조에게 ‘세자가 차마 못할 짓을 준비하고 있다’고 고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영조는 죽음을 극도로 두려워한 사람이었거든요. 아들이 이제 자기까지 위협하는 존재가 되니 결국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일각에서 주장하듯 이 과정에서 홍봉한 등 노론파가 적극 가담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일까.
“조선시대 왕은 절대 군주입니다. 영조가 자신의 신변에 위협을 느껴 아들을 죽이겠다는데 어떻게 그 앞에서 반대를 할까요. 왕이 죽기를 바라는 신하가 아니라면 왕의 뜻을 따라야지요. 노론파의 책임이 있다면 적극 가담한 것이 아니라, 적극 반대하지 않았다 정도가 맞는 해석일 겁니다.”
●영·정조 결함 불구 자기관리로 성공
그가 ‘권력과 인간’에서 영조의 성격부터 재임 기간 권력 구도, 정순왕후(영조의 계비)와 혜경궁의 관계, 정조의 즉위부터 순조대까지 두루 살핀 데에는 사도세자의 죽음을 단지 비참한 인간의 인생사로만 초점을 맞춰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바꿔 말하면 영정조 시대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정치적 사건이라는 말이다.
“어떤 사람은 ‘한중록’을 두고 칠순 여인이 감상에 젖어 쓴 회고록쯤으로 말하는데, 그야말로 연구가 덜 된 겁니다. 혜경궁은 궁중에서 70년을 지낸 최고 권력자였습니다. 그런 사람의 회고록이라면 최고 엘리트들이 분산된 사료를 모으고 사실 확인을 하는 데 투입됐을 겁니다. 사건 발생 날짜가 정확하고, 궁중 풍속이나 언어 등이 굉장히 정교해 사료로서 가치가 대단합니다.”
이어 정 교수는 “광증설과 당쟁희생설이 대립하는 것은 일부만 연구한 결과”라면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더 넓은 시각으로 사료를 찾아 역사적 사실을 판단하고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양한 사료로 판단한 영정조는 어떤 사람인가.”라고 묻자 “영조는 ‘분노의 제왕’이고, 정조는 ‘사기의 제왕’”이라는 답을 준다.
“이런 사람들이 통치한 시기가 어떻게 조선의 부흥기가 될 수 있었을까요. 철저한 자기 관리였죠. 영조는 성격적 결함이 있었지만 공과 사를 명확히 구분하면서 막강 권력을 발휘했고, 정조는 비록 독단적이긴 했지만 학문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모범이 되는 성군이었습니다. 역사를 단면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글 사진 최여경기자 kid@seoul.co.kr
2012-02-25 19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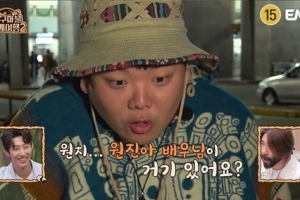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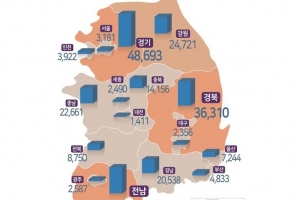






















![전쟁·기후변화… 공멸해 가는 인류 깨우다[OTT 언박싱]](https://img.seoul.co.kr/img/upload//2024/02/16/SSC_20240216012138_N.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