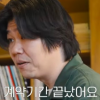“조선시대, 종기는 암 같은 난치병이었죠”
조선 왕 27명 중 절반 가까운 12명이 종기(腫氣)로 말미암아 세상을 하직했다. 구중궁궐 속 왕의 일상사는 병마와의 싸움이었고, 종기가 주범이었다. 한의사 방성혜(41)는 신간 ‘조선, 종기와 사투를 벌이다’(시대의 창)에서 피 튀기는 조선 왕실의 잔혹사를 오롯이 재현했다.

방성혜 한의사
어느 왕이 어떻게 종기에 시달렸을까. 이 책은 곤룡포 속에 가려진 군왕의 병력을 한 꺼풀 벗겨 보여 준다. 문종(5대)은 세자 때부터 등의 절반 크기에 이르는 등창에 시달렸고, 부친상(세종)도 치르지 못할 정도였다. 은침으로 종기를 따니 두서너 홉(360~720㏄)의 고름이 쏟아졌다고 실록은 기록하고 있다. 12명의 부인에게서 16남12녀를 얻은 ‘정력남’ 성종(9대)도 배꼽 아래 작은 덩어리가 만져져 민간의 종기 전문가를 부른 그날 38세의 나이로 승하했다.
반정으로 쫓겨나 군(君)으로 격하된 연산군(10대)과 광해군(15대)에겐 공통점이 있었다. 연산군은 면창, 광해군은 뺨 종기로 꽃미남 얼굴을 망쳤다. 종기가 폭군의 성정을 만들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중종(11대)도 이마, 귀 뒤, 옆구리에 차례로 생기는 종기에 재위 기간 내내 고통당했다. 효종(17대)은 머리 위 종기의 고름을 따려고 침을 맞았는데 피가 멈추지 않아 숨졌다. 현종(18대)은 재위 14년간 온갖 습창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인현왕후와 장희빈 사이에서 치명적인 삼각 로맨스를 즐긴 숙종(19대)도 엉덩이와 항문 주위 종기 등으로 46년 재위 기간에 이부자리가 마를 날이 없었다. 장희빈에 의해 쫓겨났다가 복위한 인현왕후는 종기의 독기가 심장으로 스며들어 온갖 병에 휘둘리자 “오직 빨리 죽는 것이 소원”이라고 토로했다고 한다.
조선시대 종기 스캔들의 최대 희생자는 정조(22대)였다. 정조는 크고 작은 얼굴 종기와 연적 크기의 등창을 앓았다. 의학에도 도통한 정조가 등에서 피고름이 흐르고 발열이 계속되자 “나의 체질은 인삼이 받지 않으니 약재로 인삼을 사용하지 마라.”고 신신당부했으나 내의원은 말을 듣지 않고 인삼이 들어간 경옥고를 올렸다. 혼미한 정신 상태에서 이를 먹은 정조는 종기 발생 24일 만에 숨을 거뒀다. 저자는 “인삼 시해 사건이라고 보기에는 무리지만 일종의 의료 사고”라고 말했다.
왜 이다지 종기가 창궐했을까. 왕들은 최고의 의사들이 모인 내의원의 보살핌을 받았지만, 소용이 없었다. “임금의 병은 임금이라는 자리의 특수성 때문에 생깁니다. 하루에 다섯 끼를 먹고 몸을 거의 움직이지 않을뿐더러 정치적 스트레스가 극심하기 때문이죠. 또 의관들은 자기의 목숨을 걸어야 하기에 과감한 약재의 선택이나 절개를 꺼렸어요.”
‘대보름날 부럼을 깨물어야 한 해 동안 부스럼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했을 정도로 종기는 이 땅에서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고약이 가정상비약이었다. 조선시대를 피로 물들인 종기가 사라지는 데는 50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상하수도 정비와 수세식 화장실이 감염 빈도를 낮췄고, 항생제와 소염제 오남용이 몸 밖으로 나오는 종기(外癰)을 쇠잔시켰다.
종기는 사라졌는가? 답은 ‘노’(NO)다. 대신 종기는 극단적인 음적 종기 덩어리(內癰)인 암과 온몸에 퍼져 진물을 쏟는 아토피성 피부염으로 변신했다. “눈에 보이는 종기는 거의 없어졌지만, 역사 속의 종기는 왕을 죽음으로 내몰아 역사를 바꾸었죠. 종기의 역사는 과거사가 아닙니다. 단지 암과 아토피성 피부염으로 가면만 바꾸어 썼을 뿐 여전히 우리 곁에서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노주석기자 joo@seoul.co.kr
2012-08-04 19면



























![전쟁·기후변화… 공멸해 가는 인류 깨우다[OTT 언박싱]](https://img.seoul.co.kr/img/upload//2024/02/16/SSC_20240216012138_N.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