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작품 복원에 십수년도 걸려… 땅속 유물, 보물로 재창조될 때 짜릿”
국립중앙박물관 수장고는 국내 최대의 보물창고다. 전체 면적 1만 2434.5㎡의 수장고에는 총 30여만점의 유물이 잠자고 있다. 이 가운데 국보는 67건 74점, 보물은 131건 179점에 이른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통째로 간직하고 있는 곳인 만큼 철통 보안을 자랑한다. 박물관 직원이라도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 전체 직원 500여명 가운데 출입이 가능한 인원은 유물관리부 직원 10여명에 불과하다. 수장고로 들어가려면 금고식 문을 통과하는 데서 시작해 열쇠, 카드키 등을 동원하고 최종적으로 담당 학예연구사의 지문 인식까지 최소 7단계의 ‘철통’ 보안망을 뚫어야 한다. 이렇듯 최적의 조건으로 수장고를 관리하고 문화재를 지켜내는 학예연구사 2명을 만났다. 박학수(43) 보존과학부 학예연구사와 권혁산(36) 유물관리부 학예연구사. 각각 15년, 6년 경력의 베테랑들이다.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지난 16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보존과학실에서 목제 담당 학예연구사가 금색으로 칠해진 나무 불상에 보존 처리 작업을 하고 있다.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유물 재질별로 적당한 온·습도가 다 달라 늘 신경을 써야 합니다. 습도가 올라가면 녹슬고 부패하는 청동, 철제 등 금속 유물은 습도를 최대한 낮춰주는 게 중요한 반면 종이, 목재, 직물 등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는 게 관건입니다. 조금만 온·습도가 높아도 부식되거나 곰팡이가 필 위험에 노출되는 금속과 유기물들이 다루기가 제일 까다롭죠.”(권 학예사) 부식 위험을 막기 위해 격납장과 유물상자를 짤 때는 일절 쇠못을 쓰지 않을 정도다.
현재 수장고에 있는 대표적인 유물은 2011년 프랑스에서 145년 만에 반환돼 화제를 모은 외규장각 의궤다. 의궤는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단독으로 보관돼 있다. 금속 유물 수장고에는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국보 83호와 78호가 번갈아가며 자리를 차지한다. 83호가 전시장에 나가면 78호는 수장고에 남아 있는 식이다. 보물 제527호인 김홍도의 단원풍속도첩도 늘 일부는 수장고에 자리해 있다. 빛 노출로 인한 손상의 우려 때문에 휴지기를 갖게 하기 위해 일부만 전시장에 나가기 때문이다. 명성왕후의 표범무늬 양탄자도 수장고에 남아 있는 대표적인 유물 가운데 하나다.
유물이 처음 발굴되면 30여명의 보존과학부 직원들이 매달린다. 보존 처리에 앞서 엑스선 촬영, 상태 조사와 유해균이나 벌레 등을 차단하기 위한 ‘훈증’ 작업 등을 반드시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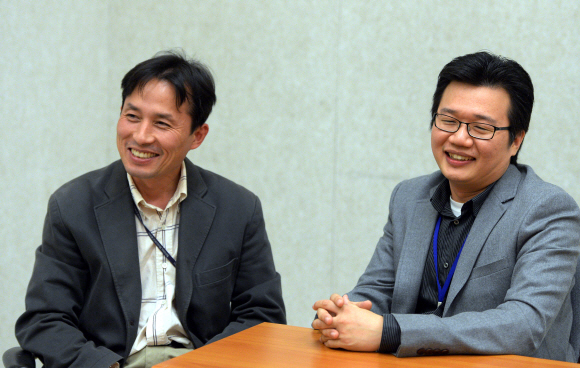

박학수 보존과학부 학예연구사(왼쪽)·권혁산 유물관리부 학예연구사
보존 처리되는 유물은 1년에 평균 1000여점에 이른다. 금속공학 박사 출신으로 금속 유물을 도맡아온 박 학예사의 손을 거쳐간 국보, 보물도 다수다. 특히 기원전 2~3세기 제작된 다뉴세문경(국보 141호)의 현재 모습은 박 학예사가 1년간 공을 들인 결과다.
“문양의 선 하나 간격이 0.25~0.3㎜ 정도밖에 안 될 만큼 정교한 청동거울인데 닳아 없어진 부분을 복원하라는 지시가 떨어졌어요. 당시에는 그 거울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제작 기술도 밝혀진 게 없어 어떻게 복원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복원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거울 단면에 남아 있던 거푸집 재료를 발견했어요. 흙을 굳힌 뒤 새겨서 청동을 부어 떼낸 것이죠. 제작 기술을 알아낸 뒤 부서진 문양 조각 19개를 붙이는데 한 조각을 붙일 때마다 1시간씩 손으로 붙들고 있어야 했어요. 그 작업만 한 달이 걸렸습니다. 바다에서 건진 목제 유물은 염분을 빼느라 복원에 십수년이 걸리기도 해요.”(박)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지난한 작업을 거쳐 유물이 전시장에 오를 때, 학예사들은 가장 뿌듯하다고 입을 모은다. “발견 당시에는 형태도 제대로 알아볼 수 없었던 유물들이 제작 당시의 모습을 최대한 회복해 관람객들을 만날 때가 가장 보람차죠.”(박) “저는 땅 속에서 발굴된 유물들을 박물관으로 가져와 등록하는데, 사람으로 치면 주민등록증을 만들어주는 것과 같죠. 그렇게 이름을 얻은 유물들이 실제 전시대에 오르기까지 보이지 않는 노력이 많다는 걸 한번쯤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권)
정서린 기자 rin@seoul.co.kr
2013-10-19 14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