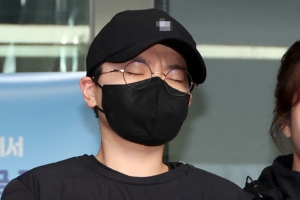김세연 “보수정권, 아무 문제없다 큰소리치진 않아”


대구 찾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0일 오후 대구 수성구 라온제나호텔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안 대표는 이날 지역 현안 간담회 등에 참석하기 위해 대구를 찾았다. 2020.11.20 뉴스1
22일 안 대표의 유튜브 채널 ‘안박싱’은 이날 ‘안철수x김세연 혁신 토크 1편 -야권 혁신 위해 함께한다’ 영상을 공개했다.
김 전 의원은 대담에서 “지금의 보수정당이라면 기후위기와 불평등의 심화 등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보수정당의 이념이었던 데서 훨씬 확장해서 가령 생태주의, 페미니즘까지도 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근본적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이런 얘기를 들으면 기존 보수정당 주류에선 격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것. 이런 대목에서 보면 아직 갈 길이 멀고, 지금이 몰락의 끝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안 대표는 “여야 대결 구도는 호감 대 비호감, 신사 대 꼰대, 민주 대 적폐로, 이 구도가 유지되는 한 이길 수가 없다”며 “소통과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건 양쪽 다 비슷하다. 어떻게 소통과 공감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면에서 다양한 노력을 하는 게 야권 혁신”이라고 강조했다.
야권 혁신 플랫폼 필요성 ‘의견 일치’김 전 의원은 “국민 삶으로부터 멀어져 있다고 보이는 정치가 가까이 가서 현실적인 문제를 풀어주는 협력자, 친구 같은 대상이 돼 경쟁하자는 취지로 첫인상을 받았다”고 말했고, 안 대표는 “굉장히 정확하게 말해줬다”고 반색했다.
안 대표는 “현재 제1야당만으로는 정부 여당을 견제하거나 선거에서 승리하기 힘드니까, 그러면 야권 전체가 결국 힘을 합해야지 겨우 비등비등한 정도가 될 것”이라며 “즉, 제1야당뿐 아니라 중도, 합리적 개혁을 바라는 진보적인 분들까지도 다 협력할 수 있는 틀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 전 의원은 “혁신 경쟁 또 혁신 협력을 하기 위한 큰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걸 무슨 당을 하나로 합치기보다는 대화, 협력 플랫폼으로 작동하게 하는 것은 우리 정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호응했다.
또 “그 플랫폼에서 추구하는 연대의 수준이 사안별 협력이 되든, 아니면 상시 협의체가 되든, 아니면 주요 선거에서 연합공천이 되든, 아니면 가장 강도가 높은 합당이 되든 여러 가지 협력 수준을 놓고 사안별로 다르게 할 수도 있는 것. 결과보다는 대화 과정에 더 중점을 두고 간다면 지금보단 훨씬 다원적, 합리적 정치가 구현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야권 혁신을 위해 안 대표와 힘을 합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김 전 의원은 “정치권에서 한발 물러난 상태라서 우리나라 공동체 발전을 위해 좋은 마음, 생각으로 임하는 그런 노력에는 항상 힘을 보탤 생각”이라며 “익히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생각이 비슷한 부분이 훨씬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반가운 마음”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지금은 정치권에서 한발 물러난 입장이다. 구체적인 특정 캠프만을 위해 일 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우리나라와 공동체 전체를 위해 좋은 마음으로 좋은 방안을 찾아내고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움직임이 있다면 어떤 거든 응원하고 마음을 함께하겠다”고 했다.
안 대표는 “영향력 있는 분이 생각이 같다는 게 굉장히 큰 힘이 된다.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이런 분이 한 분 한 분 많아지면 결국은 변화라는 것이 막연하거나 절망적이지 않은, 변화를 바라는 희망을 가지게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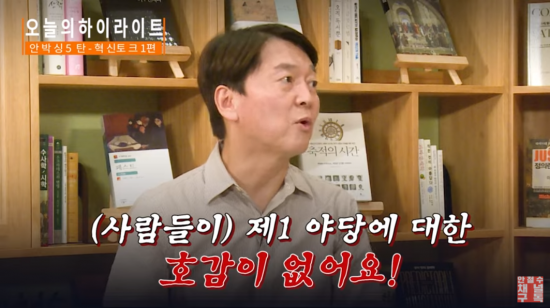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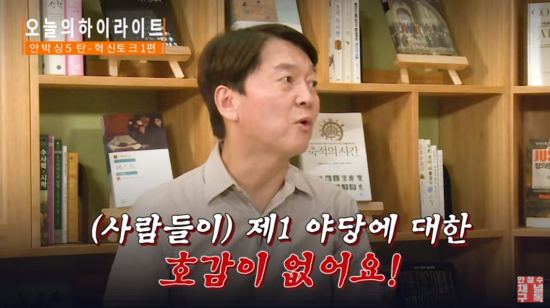
유튜브 채널 ‘안박싱’캡처
나아가 “예전 정권과 (현 정권이) 다른 면이 하나 있다. 보수 정권에선 국민적으로 많이들 갖고 있는 인식(을 공유하거나), 그로 인한 최소한의 양심에서 우러나는 부분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이렇게 ‘우린 아무 문제 없다’고 큰소리치진 않았다. 그런 위선의 면이 훨씬 지금 상태선 강화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안 대표도 “한마디로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이라며 “예전에는 뭔가 능력이 부족해서 일을 잘못하거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진보 정권이든 보수 정권이든 ‘잘못됐다’ 사과하고 조치를 취하고 부끄러움을 알지 않았나. 이번 정권만은 그런 모습이 안 보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