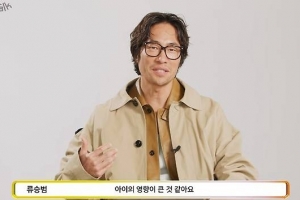예술·언어치료 수요 느는데 부가세 부담·행정절차 복잡해
언어·운동·음악·미술 치료 등 다양한 재활 치료법이 최근 인기를 끌고 있지만, 허술한 법망, ‘치료’와 ‘특수교육’ 사이의 애매한 지위 때문에 이용자·운영자 모두가 불편을 겪고 있다. 올 초 시행된 개정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언어·미술·음악 등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장애인 복지시설로 구분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민간에서 발급한 각종 자격증이 수백 개에 이르고, 해당 기관의 신고 의무가 지켜지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언어·운동·음악·미술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지난 1월부터 장애인 복지시설로 분류돼 신고 의무가 있다. 그동안 개인이 운영하는 재활치료 기관에 대한 설치와 관리 근거가 없어 행정 감독의 사각지대로 존재해 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현장에서 각종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영자들은 “재활 치료도 엄연한 치료의 한 종류인데 단순히 복지시설로 분류해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면서 “선진국에서는 보편적인 발달장애 치료법으로 인정받고 있는 음악·언어 치료법이 국내에서는 치료와 교육, 복지서비스 사이에 끼어 보조적인 역할에 그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언어·음악·미술·놀이 치료센터 등 각 분야의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영자들은 현재 언어치료사나 음악치료사 등의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 현행 의료법이 의료면허가 없는 의료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치료소라는 이름도 쓸 수 없어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 운영자들은 대부분 ‘발달센터’ 혹은 ‘심리연구소’ 등의 간판을 내걸고 있다. 또 복잡한 행정 절차 탓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대학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한 뒤 음악치료 분야의 민간 자격증을 딴 오기숙(38·여)씨는 지난해 서울에 음악치료센터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장벽에 부딪혔다.
오씨는 “결국 ‘기타 서비스업’으로 등록해야 했다”면서 “학원은 비과세 대상이 되는데 치료실은 부가가치세 10%까지 내야 해 사업자 등록을 피하는 경우가 더 많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사설 재활치료 기관은 1000여곳으로 추정되지만 각 지자체에 신고한 곳은 10% 남짓이다.
미신고 사설 재활치료 기관의 난립은 이를 이용하는 학부모에게도 부담이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기관에서는 정부와 각 지방교육청 등이 지원하는 20만~22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사용할 수 없어 이용료 전액을 학부모가 부담해야 한다.
발달장애를 겪고 있는 네 살 아들이 일주일에 두 번씩 프리랜서 언어치료사에게 개인 교습을 받는 주부 현모(41)씨는 “40분 수업에 5만원이라는 높은 가격이 부담이지만 꾸준히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다”며 답답해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18일 “3년간의 신고 유예기간을 거치면 사설 재활치료 기관 대부분이 제도권으로 들어와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
2013-08-19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