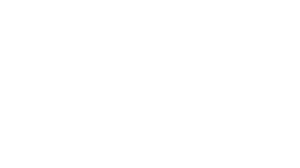мЎ°м„ мЎұліҙлӢӨ м—ҙм•…н•ң мІҳмҡ°, нғҲл¶Ғмһҗл“Өмқҳ лҲҲл¬ј

нғҲл¶Ғм—¬м„ұмқҳ лҲҲл¬ј
гҖҖм„ңмҡёмӢ л¬ёмқҙ л§ҢлӮң нғҲл¶Ғмһҗмқҳ мғҒлӢ№мҲҳлҠ” вҖҳлӮҷмҳӨмһҗвҖҷлқјлҠ” м—ҙнҢЁк°җмқ„ кіөнҶөм ҒмңјлЎң к°–кі мһҲм—ҲлӢӨ. лӮЁн•ң мһҗліёмЈјмқҳ мӮ¬нҡҢмқҳ вҖҳкІҪм ңм Ғ мһҗмң вҖҷлҠ” мҳӨнһҲл Ө к·ёл“Өм—җкІҢ л¶Ҳк°ҖлҠҘн•ң лҜёлһҳм—җ лҢҖн•ң кё°лҢҖл§Ңмқ„ нӮӨмҡ°лҠ” вҖҳнқ¬л§қ кі л¬ёвҖҷмқҙм—ҲлӢӨ.
гҖҖ2008л…„ нғҲл¶Ғн•ң мқҙлҜјм •(32В·к°ҖлӘ…В·м—¬)м”ЁлҠ” м§ҖлӮңн•ҙ 5мӣ” кІҪкё°лҸ„мқҳ н•ң мһҗлҸҷм°Ё л¶Җн’ҲнҡҢмӮ¬м—җ м·Ём§Ғн–ҲлӢӨ. мӣ”кёүмқҖ мөңм Җмһ„кёҲ мҲҳмӨҖмқё 130л§Ңмӣҗ. к·ёлӮҳл§Ҳ мһ…көӯ 7л…„л§Ңм—җ л¶Ғн•ң м–өм–‘мқҙ мӨ„л©ҙм„ң м·Ём—…м—җ м„ұкіөн–ҲлӢӨ. н•ҳм§Җл§Ң, м§ҖлӮңн•ҙ нҳјмқёмӢ кі лҘј н•ң лӮЁнҺёкіј м •мӢқмңјлЎң кІ°нҳјмӢқмқ„ мҳ¬лҰ¬лҠ” кІғмқҖ кҝҲк°ҷмқҖ м–ҳкё°лӢӨ. л¶Ғн•ңм—җ мһҲлҠ” к°ҖмЎұм—җкІҢ лҸҲмқ„ ліҙлӮҙл©ҙ мһ…м—җ н’Җм№ н•ҳкё°лҸ„ лІ„кІҒлӢӨ.
гҖҖвҖңк·ёлҸҷм•Ҳ нҺёмқҳм җ, мӢқлӢ№, PCл°© л“ұм—җм„ң мқјн–ҲлҠ”лҚ°, нғҲл¶ҒмһҗлқјлҠ” мӮ¬мӢӨмқ„ м•ҢкІҢ лҗҳл©ҙ лҢҖл¶Җ분 мӮ¬мһҘлӢҳл“Өмқҙ лҲҲл№ӣмқҙ нҷ• лӢ¬лқјм ёмҡ”. к·ёлӮ л¶Җн„° м«“м•„лӮј кө¬мӢӨл§Ң м°ҫкі . мӣ”кёүмқ„ л–јм–ҙлЁ№лҠ” кІҪмҡ°лҸ„ м—¬лҹ¬ лІҲмқҙм—Ҳм–ҙмҡ”. н•ӯмқҳлқјлҸ„ н•ҳл©ҙ вҖҳл„Өк°Җ лҲ„кө¬ лҚ•м—җ м§ҖмӣҗкёҲмқ„ л°ӣкі мқҙ л•…м—җ л°ң л¶ҷм—¬ мӮ¬лҠ”лҚ°вҖҷ лқјл©° мҳӨнһҲл Ө лҚ” нҷ”лҘј лғҲмЈ .вҖқ
гҖҖк№Җ진мҲҷ(34В·к°ҖлӘ…В·м—¬)м”ЁлҠ” 2005л…„ 9мӣ” мӨ‘көӯм—җ мһҘмӮ¬лҘј н•ҳлҹ¬ к°”лӢӨк°Җ мқёмӢ л§Өл§ӨлҘј лӢ№н•ҙ к°•м ңлЎң м„ұл§Өл§ӨлҘј н•ҳкІҢ лҗҗкі , 2008л…„ 10мӣ” к°„мӢ нһҲ нғҲм¶ңн•ҙ н•ңкөӯм—җ мҷ”лӢӨ. к·ёлҠ” вҖңм ҖлҘј л°ӣм•„мӨҖ н•ңкөӯм—җ к°җмӮ¬н•ң л§ҲмқҢмқҖ мһҲм§Җл§Ң нҡҢмӮ¬ м•Ҳм—җм„ңмқҳ м°Ёлі„мқҖ м°ёкё° нһҳл“ӨлӢӨвҖқкі л§җн–ҲлӢӨ. вҖңм ңк°Җ лӢӨлӢҲлҠ” кіөмһҘмқҖ м§Ғмӣҗмқҙ 60лӘ… м •лҸ„мқёлҚ° нғҲл¶ҒмһҗлҠ” м Җлҝҗмқҙм—җмҡ”. 30%лҠ” н•ңкөӯмқё, 70%лҠ” мЎ°м„ мЎұмқёлҚ° м ҖлҠ” мЎ°м„ мЎұліҙлӢӨ лҚ” лӮ®мқҖ лҢҖмҡ°лҘј л°ӣм•„мҡ”.вҖқ
гҖҖкі н•ҷл Ҙ нғҲл¶Ғмһҗл“ӨлҸ„ мӮ¬м •мқҖ лі„л°ҳ лӢӨлҘҙм§Җ м•ҠлӢӨ. кі к°қмқ„ мғҒлҢҖн•ҳлҠ” м„ң비мҠӨм§ҒмқҖ м–өм–‘ л°Ҹ н–үлҸҷмқҙ вҖҳнғҲл¶ҒмһҗмҠӨлҹҪлӢӨвҖҷлҠ” мқҙмң лЎң л©ҙм ‘м—җм„ң л–Ём–ҙм§Җкё° мқјм‘ӨлӢӨ. 2013л…„ лӘ…л¬ёлҢҖ мӮ¬нҡҢліөм§Җн•ҷкіјлҘј мЎём—…н•ң м •кё°нӣҲ(44В·к°ҖлӘ…)м”ЁлҠ” вҖңмқёмӮ¬ лӢҙлӢ№мһҗлҠ” нғҲл¶Ғмһҗм—¬м„ң нғҲлқҪн•ң кІғмқҖ м•„лӢҲлқјкі н–Ҳм§Җл§Ң, лӮҳмӨ‘м—җ л”°лЎң м•Ңм•„ліҙлӢҲ кІ°көӯ нғҲл¶Ғмһҗм—¬м„ң к·ёлһ¬лҚҳ кІғвҖқмқҙлқјл©° вҖңл¶Ғн•ңкіј н•ңкөӯмқҳ м–ём–ҙ м°Ёмқҙк°Җ нҒ¬кі , м—…л¬ҙ мҡ©м–ҙлӮҳ мҳҒм–ҙлҠ” мғҲлЎң мқөнҳҖм•ј н•ҳкё° л•Ңл¬ём—җ м–ҙл өкІҢ м·Ём§Ғмқ„ н•ҳкі кёҲл°© мӢӨм§Ғн•ҳлҠ” кІҪмҡ°лҸ„ мһҲлӢӨвҖқкі л§җн–ҲлӢӨ.
гҖҖм§ҖлӮңн•ҙ 8мӣ” м„ңмҡём—җ мһҲлҠ” 4л…„м ң лҢҖн•ҷмқ„ мЎём—…н•ң л°•лҜёмҳҒ(32В·м—¬)м”ЁлҠ” вҖңн•ңкөӯм—җм„ң лӮҳкі мһҗлһҖ м ҠмқҖмқҙл“ӨлҸ„ м·Ём—…л¬ёмқҙ л°”лҠҳкө¬л©ҚмқёлҚ°, мҡ°лҰ¬лҠ” мҳӨмЈҪн•ҳкІ лҠҗлғҗвҖқл©° вҖңл¶Ғн•ңм—җм„ң н•ңкөӯ л“ңлқјл§ҲлҘј ліҙл©ҙм„ң н–үліөн•ң мӮ¶мқ„ кҝҲкҝЁлҠ”лҚ°, к·ёкұҙ м •л§җ мһҳлӘ»лҗң нҷҳмғҒмқҙм—ҲлҚҳ кІғ к°ҷлӢӨвҖқкі л§җн–ҲлӢӨ.
мқҙм„ұмӣҗ кё°мһҗ lsw1469@seoul.co.kr
Copyright в“’ м„ңмҡёмӢ л¬ё All rights reserved. л¬ҙлӢЁ м „мһ¬-мһ¬л°°нҸ¬, AI н•ҷмҠө л°Ҹ нҷңмҡ© кёҲм§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