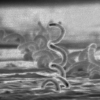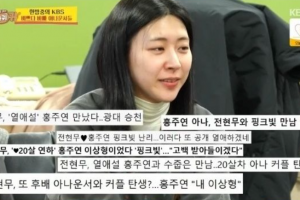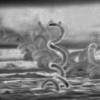경희대·서울대 공동 연구팀 원인 규명


정지훈 경희대 한의대 학술연구교수
정지훈 경희대 한의대 학술연구교수가 주도하고 서울대 의대 연구진이 참여한 공동연구팀은 신경 손상으로 인한 만성통증은 뇌의 통증 조절 시스템이 오작동하면서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고 만성화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생물학 분야 국제학술지 ‘커런트 바이올로지’ 25일자에 실렸다.
신경 손상으로 인한 신경병성 통증이 느껴지는 메커니즘은 말초와 척수 수준에서 밝혀지기도 했지만 이를 바탕으로 한 통증 억제 방법은 실제 환자에게서는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통증이 만성화되면 말초나 척수신경을 넘어 뇌의 역할이 커진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련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에 연구팀은 생쥐에게 신경병성 통증을 유발시키도록 조작하고서 일반 생쥐의 뇌의 활동과 변화를 측정했다. 그 결과 극심한 만성통증을 겪는 생쥐는 통증 감각 조절에 관여하는 중뇌의 ‘수도관 주위 회색질’(PAG)이라는 영역의 활성도가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것이 관찰됐다. 일반 생쥐는 중뇌 PAG에서 ‘대사성 글루타메이트 수용체 5’라는 물질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돼 있다는 것도 확인됐다. 즉 뇌의 통증조절 기능이 정상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 물질이 지속적으로 활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연구팀은 만성통증을 겪는 생쥐에게 대사성 글루타메이트 수용체 5의 활성을 높이면 강력한 진통효과를 발휘해 만성통증이 개선되는 것이 관찰됐고 반대로 일반 생쥐에게서 대사성 글루타메이트 수용체 5 활성을 차단하면 신경병성 통증을 겪는 생쥐처럼 극심한 통증을 느끼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 교수는 “이번 결과는 신경병성 통증을 비롯한 다양한 통증의 만성화 기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줘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용하 기자 edmondy@seoul.co.kr
2020-09-30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