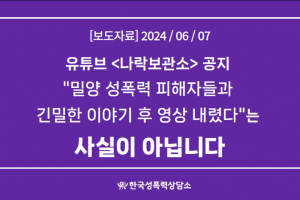소설가 김금희 두 번째 소설집 ‘너무 한낮의 연애’ 펴내
보통의 삶서 튕겨 나온 사람들 그려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올해 문학동네 젊은작가상 대상, 지난해 신동엽문학상과 젊은작가상을 연이어 수상하며 문단의 재능 있는 이야기꾼으로 떠오른 김금희 작가는 내년 봄부터 연재할 장편소설을 준비 중이다. 그는 “개인이 갖고 있는 상처가 어떻게 혐오로 작동하게 되는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혐오’에 대해 다루고 싶다”고 했다.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선배, 사과 같은 거 하지 말고 그냥 이런 나무 같은 거나 봐요. 언제 봐도 나무 앞에서는 부끄럽질 않으니까, 비웃질 않으니까 나무나 보라고요.”
이 순간을 김금희 소설의 요체라 해도 좋을 것 같다. 첫째, 사회의 트랙, 사람들의 인정 밖으로 밀려난 이들 안에 의연함, 순정함이 반짝인다는 것. 둘째, 그를 다독이고 지켜보는 타인의 시선이 연민과 온기를 머금고 있다는 것이다.
“제 첫 소설집에서는 ‘연민’이라는 단어가, 이번 소설집에서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두드러져요. 제가 소설로 보여 주고 싶은 것도 결국 연민과 사랑이에요. 우리는 연대라는 게 가능하다고 믿고 싶어 해요. 살면서 그런 순간들과 분명 마주쳤거든요.”
처절하고 눅진해야 할 상황에서도 명랑함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뭘까.
“이런 말이 하고 싶었던 거죠. ‘이 시스템이 잘못돼 있는 거야. 사회의 트랙 위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뭔가 모자란 사람들도 아니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불쌍하지도 않아. 왜 명랑하고 담담하냐고? 원래 그래. 그 정도의 수입이 없다고, 그 정도의 위치가 아니라고, 그 지역에 살지 않는다고 너네 생각처럼 우울하게 살고 있지 않아’라고요.”
트랙 위에서 떨어져 나온 사람들의 열패감을 ‘다정한 무심함’(강지희 문학평론가)으로 지켜볼 수 있는 데는 작가의 경험이 재료가 됐다. 대학 시절 따돌림당하며 받은 상처, 다니던 출판사를 그만둘 때 느꼈던 ‘지고 나온 느낌’, 함께 직장에 채용됐다가 수습 기간이 끝나고 잘린 동료에 대한 부채 의식 등이 ‘세실리아’, ‘조중균의 세계’ 등에 녹아 있다.
“예술이란 건 자기 상처를 파서 완성하는 면이 있잖아요. 제가 예술적인 소설을 쓰는 게 아닌데도 글을 쓸 때면 제 상처, 트라우마를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상처들을 작동시키다 보면 결국 시스템이 잘못됐다는 생각, 그건 결국 우리의 무수한 선택과 방조 때문이라는 결론에 이르죠.”
작가는 일상을 견디다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상태가 됐을 때 누군가에게 ‘왜 이렇게 됐습니까, 괜찮습니까’ 묻고 싶어진다고 했다. 타인에 대한 이런 곡진한 물음으로 뽑아져 나오는 소설로 그는 독자들 곁에 선다. 언제 봐도 부끄럽지 않고, 비웃지 않는 나무처럼.
정서린 기자 rin@seoul.co.kr
2016-06-06 19면